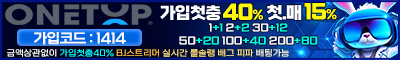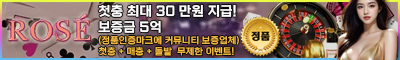나의 아름다운 두 노예 - 16부
관리자
SM
0
5409
2018.12.09 00:49
컥… 독자님들이 해피 엔딩으로 하라캤는데……. 제발 돌 던지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_- 이미 설정을 그렇게 했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
어렴풋이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파온다. 마치 솜에 물을 먹인 듯 몸이 축 늘어져버렸다. 그런 상황에서도 연진은 안간힘을 쓰며 몸을 일으켰다.
"죽었다!"
이미 죽어버렸다. 어머니로써의 본능은, 연진에게 당신의 아기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내가 그녀의 하복부를 타격했을 때 대충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았다. 정신을 잃으면서도 낙태가 되지 않길 간절히 빌었건만 본능적으로 아기가 이미 죽어버렸음을 느꼈다.
"흐흑…"
정신이 어지럽고 몸이 무거운 가운데 눈물을 왈칵 쏟아내니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하지만 그게 대수랴. 주인님의 씨를 받아 뱃 속에 고이 간직한 그녀의 아기가 죽어버렸건만!
그녀의 눈물샘이 고장난 듯 줄줄히 흘렀다. 마치 흐르는 냇물처럼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물이 따스하다. 그녀가 유일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이였다.
"나같은 년은 이런 감각을 느낄 자격도 없어."
그녀를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했다. 주인님의 씨앗이라는 점도 그랬거니와 스스로에게도 아이라는 존재는 큰 의미였건만… 죽어간 아이의 고통이 그녀에게 전달되는 듯 했다. 그리고 한없이 죄스러웠다. 주인에게도, 아기에게도. 주인은 그녀를 싸구려 노예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 스스로 당당한 정훈의 여자이고 싶었다. 그런데 다른 남자한테 겁간을 당했고 아이도 잃었다.
"당신은 마음이 넓으니 날 용서 하실테죠. 그래도 난 주인님을 볼 용기가 없답니다. 당신이 날 노예가 아닌 인격체로 대해 주셨는데도 다른 사내에게 몸을 주고 아이도 잃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즐겁게 떠들고 웃고 또 당신에게 안기겠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렇게 생각했다. 게다가 죽어버린 아이가 외로움에 울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 스스로 외로움에 얼마나 진저리를 쳤던가.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다.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저승길을 동행하리라!
그녀는 자신을 범한 사내가 들고 왔던 칼을 들었다. 잠들어 있는 주인의 얼굴을 한번만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러다가 주인이 깨어나 그녀의 모습을 발견 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있는 핸드백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립스틱을 빼들었다.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적고 싶은데 연필이나 볼펜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노예들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립스틱을 꺼내든 것이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입자가 있었고 그에게 겁탈 당했으며 아이가 죽어버렸다는 내용을 썼다. 자살하겠다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미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또 하나의 물줄기가 지나간다. 립스틱으로 글씨를 써야 했기에 잠깐 내려 놓았던 칼을 다시 쥐었다. 그리고…
푹…
털썩.
그녀는 스스로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목덜미에 꽂으려 했지만 두려워서 왼쪽 가슴, 심장 부근이라 추측되는 부위에 주저없이 칼을 찔러 넣었다.
"윽… 허어, 허어…"
심장에 검이 꽂혔다는 사실과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두려움에 눈을 부릅뜨고 허어, 허어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주인님…"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던 그녀는 결국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난 그래도 죽으면 기억해 줄 사람은 있어, 주인님이 날 기억해 주실꺼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정훈은 눈 앞에 벌어진 상황이 도저히 현실인 것 같지가 않아 표정이 멍해졌다. 하늘이 울음 섞인 비명을 지르며 연진 언니가 죽어 있다고 말했을 때도 믿지 못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의 눈동자엔 불신만이 가득 찼다. 한 쪽 구석에 초라하게 쓰러진 채 싸늘한 주검이 된 그녀.
터벅… 터벅…
마치 혼백이 빠져나간 듯 지극히 무표정인 상태로 발만 움직여 그녀에게 걸어갔다. 그 모습이 마치 감정이 전혀 없는 로브트와 같았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연진의 심장에 틀어박힌 칼을 빼 버릴 때까지 그는 무표정 했다. 체온이라곤 한점 없는 연진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나서야 그는 주루룩 눈물을 흘렸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그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품안에 있는 연진은 조금도 체온은 발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정훈은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음부에 사내의 정액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리고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연진이 죽으며 써내려간 그 침입자라는 놈의 짓이리라. 하지만 지독하게 올라오는 슬픔과 상실감에 범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늘아…"
정훈은 놀라고, 또 슬퍼서 울고 있는 하늘을 자신의 품에 앉았다. 하늘은 그야말로 펑펑 울었다. 한참을 울던 하늘은 돌연 울음을 멈추더니 정훈이 연진의 심장에서 빼낸 칼을 빼앗았다.
"흑, 주인님. 저도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하면 안되요. 어흐흑…"
아마도 하늘은 주인이 연진을 따라 자결할까 두려워 미리 칼을 뺐었나보다. 그녀는 칼을 한 쪽에 내려 놓고는 말했다.
"난 맨날 연진 언니 다음 이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라도 좋아요. 나도 주인님 아기 가져보고 싶고, 주인님한테 요리도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아요. 연진 언니도 그걸 바랄 꺼에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을 위해서라도 상처를 딛고 열심히 살아야 했다. 문득 연진이 한 말이 생각났다.
"죽음 자체엔 두려움이 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 무서워요. 우린 죽어봤자 화장해서 어디 강이나 바다에 또다시 버려질 뿐, 기억해 줄 사람도,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울어줄 사람도 없거든요. 그건 정말 무서워요."
정훈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했다.
"기억해주마. 나란 놈이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내가 널 기억해주마."
아픔과 시련, 지독한 외로움에 아파했던 연진은 그렇게 한줄기 고혼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녀로 인해 또 하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두 남녀. 정훈과 하늘. 그들이 남았을 뿐이다.
다음 편이 마지막(에필로그) 편 입니다.
살려주세요 -_- 이미 설정을 그렇게 했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
어렴풋이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파온다. 마치 솜에 물을 먹인 듯 몸이 축 늘어져버렸다. 그런 상황에서도 연진은 안간힘을 쓰며 몸을 일으켰다.
"죽었다!"
이미 죽어버렸다. 어머니로써의 본능은, 연진에게 당신의 아기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내가 그녀의 하복부를 타격했을 때 대충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았다. 정신을 잃으면서도 낙태가 되지 않길 간절히 빌었건만 본능적으로 아기가 이미 죽어버렸음을 느꼈다.
"흐흑…"
정신이 어지럽고 몸이 무거운 가운데 눈물을 왈칵 쏟아내니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하지만 그게 대수랴. 주인님의 씨를 받아 뱃 속에 고이 간직한 그녀의 아기가 죽어버렸건만!
그녀의 눈물샘이 고장난 듯 줄줄히 흘렀다. 마치 흐르는 냇물처럼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물이 따스하다. 그녀가 유일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이였다.
"나같은 년은 이런 감각을 느낄 자격도 없어."
그녀를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했다. 주인님의 씨앗이라는 점도 그랬거니와 스스로에게도 아이라는 존재는 큰 의미였건만… 죽어간 아이의 고통이 그녀에게 전달되는 듯 했다. 그리고 한없이 죄스러웠다. 주인에게도, 아기에게도. 주인은 그녀를 싸구려 노예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 스스로 당당한 정훈의 여자이고 싶었다. 그런데 다른 남자한테 겁간을 당했고 아이도 잃었다.
"당신은 마음이 넓으니 날 용서 하실테죠. 그래도 난 주인님을 볼 용기가 없답니다. 당신이 날 노예가 아닌 인격체로 대해 주셨는데도 다른 사내에게 몸을 주고 아이도 잃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즐겁게 떠들고 웃고 또 당신에게 안기겠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렇게 생각했다. 게다가 죽어버린 아이가 외로움에 울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 스스로 외로움에 얼마나 진저리를 쳤던가.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다.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저승길을 동행하리라!
그녀는 자신을 범한 사내가 들고 왔던 칼을 들었다. 잠들어 있는 주인의 얼굴을 한번만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러다가 주인이 깨어나 그녀의 모습을 발견 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있는 핸드백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립스틱을 빼들었다.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적고 싶은데 연필이나 볼펜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노예들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립스틱을 꺼내든 것이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입자가 있었고 그에게 겁탈 당했으며 아이가 죽어버렸다는 내용을 썼다. 자살하겠다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미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또 하나의 물줄기가 지나간다. 립스틱으로 글씨를 써야 했기에 잠깐 내려 놓았던 칼을 다시 쥐었다. 그리고…
푹…
털썩.
그녀는 스스로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목덜미에 꽂으려 했지만 두려워서 왼쪽 가슴, 심장 부근이라 추측되는 부위에 주저없이 칼을 찔러 넣었다.
"윽… 허어, 허어…"
심장에 검이 꽂혔다는 사실과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두려움에 눈을 부릅뜨고 허어, 허어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주인님…"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던 그녀는 결국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난 그래도 죽으면 기억해 줄 사람은 있어, 주인님이 날 기억해 주실꺼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정훈은 눈 앞에 벌어진 상황이 도저히 현실인 것 같지가 않아 표정이 멍해졌다. 하늘이 울음 섞인 비명을 지르며 연진 언니가 죽어 있다고 말했을 때도 믿지 못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의 눈동자엔 불신만이 가득 찼다. 한 쪽 구석에 초라하게 쓰러진 채 싸늘한 주검이 된 그녀.
터벅… 터벅…
마치 혼백이 빠져나간 듯 지극히 무표정인 상태로 발만 움직여 그녀에게 걸어갔다. 그 모습이 마치 감정이 전혀 없는 로브트와 같았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연진의 심장에 틀어박힌 칼을 빼 버릴 때까지 그는 무표정 했다. 체온이라곤 한점 없는 연진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나서야 그는 주루룩 눈물을 흘렸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그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품안에 있는 연진은 조금도 체온은 발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정훈은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음부에 사내의 정액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리고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연진이 죽으며 써내려간 그 침입자라는 놈의 짓이리라. 하지만 지독하게 올라오는 슬픔과 상실감에 범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늘아…"
정훈은 놀라고, 또 슬퍼서 울고 있는 하늘을 자신의 품에 앉았다. 하늘은 그야말로 펑펑 울었다. 한참을 울던 하늘은 돌연 울음을 멈추더니 정훈이 연진의 심장에서 빼낸 칼을 빼앗았다.
"흑, 주인님. 저도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하면 안되요. 어흐흑…"
아마도 하늘은 주인이 연진을 따라 자결할까 두려워 미리 칼을 뺐었나보다. 그녀는 칼을 한 쪽에 내려 놓고는 말했다.
"난 맨날 연진 언니 다음 이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라도 좋아요. 나도 주인님 아기 가져보고 싶고, 주인님한테 요리도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아요. 연진 언니도 그걸 바랄 꺼에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을 위해서라도 상처를 딛고 열심히 살아야 했다. 문득 연진이 한 말이 생각났다.
"죽음 자체엔 두려움이 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 무서워요. 우린 죽어봤자 화장해서 어디 강이나 바다에 또다시 버려질 뿐, 기억해 줄 사람도,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울어줄 사람도 없거든요. 그건 정말 무서워요."
정훈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했다.
"기억해주마. 나란 놈이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내가 널 기억해주마."
아픔과 시련, 지독한 외로움에 아파했던 연진은 그렇게 한줄기 고혼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녀로 인해 또 하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두 남녀. 정훈과 하늘. 그들이 남았을 뿐이다.
다음 편이 마지막(에필로그) 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