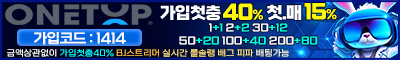우울한 날의 광시곡 - 10부
관리자
로맨스
0
5001
2018.12.23 14:16
석채가 은수의 등 위에 무너지면서 은수도 무릎이 풀려 침대 위에 그대로 엎어졌다.
석채는 은수의 등에 자신의 몸을 포갠 채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거워요…그만 내려와요”
은수가 기어들어가는 듯한 말을 뱉자 그제서야 석채는 옆으로 굴러 내려갔다.
자신이 싼 정액이 가슴 곳곳에 묻어있었다.
“이제 우리 어쩌죠?”
은수가 똑바로 누운 석채의 가슴 안쪽으로 파고 들며 작게 속삭였다.
석채는 팔을 은수의 목 아래로 뻗어 안쪽으로 잡아 당겼다.
겨드랑이쪽으로 은수의 꼿꼿이 선 젖꼭지가 느껴졌다.
“후…..우”
석채는 천장을 햔해 한숨을 내 쉬었다.
솔직히 은수가 이 정도로 명기일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자신을 거쳐간 어떤 여자보다도 뜨거운 여자였다.
기정이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젠 죽어도 은수를 포기하기 싫었다.
하지만 오늘 은수는 그저 돈이 필요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몸을 준 것이 아닌가.
석채는 이런 만남이 오늘로 끝나지 않을까 두려웠다.
“우리 오늘처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석채는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저….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은수가 눈을 치켜 뜨고 석채를 올려다 보았다.
석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오늘 나오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건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무척 망설였어요”
석채는 이해한다는 듯 손으로 은수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은수의 살결은 대리석처럼 매끄러웠다.
“제 몸을 주겠다는 생각도 지난 번에….목욕탕에서…………..”
“그 장면요? 하하하”
은수는 입을 삐죽이며 손으로 석채의 가슴을 쳤다.
“어차피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용기를 내봤던 거예요…사실 저………..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남편이 처음이예요”
“………………..”
“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런데 오늘 윤사장님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웠지만, 두 번이나….”
은수는 말을 하다 멈췄다.
부끄러움에 목덜미까지 빨갛게 변해 있었다.
“두 번이나 뭐요?”
석채는 일부러 짖궂게 물었다.
“두 번이나…….오르가즘을 느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예요. 저 자신도 제 몸이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기정이는 잘 안해주나요?”
얼떨결에 말을 뱉어놓고 석채는 움찔했다.
지금 기정이라는 이름을 뱉는다는 것은 잘 달궈진 후라이팬에 모래를 뿌리는 격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남편한테 별 불만은 없었어요…둘 다 애무도 잘 할 줄 몰랐고, 그저 섹스라는 것이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 느낌 없이 했으니까요”
기정이 이름이 나왔어도 의외로 은수는 담담했다.
“그런데 아까 발가락까지………… 발가락까지 빨아줄 때는 온 몸의 잔털까지 다 일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좋았어요?”
“예…”
은수는 다시 낯을 붉혔다.
“이제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예전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나도 그래요. 은수씨”
석채는 앞으로 은수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늘 갑자기 만나자는 것이나,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나, 몸을 주겠다는 것 모두가 내게도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사실 기정이 때문에 은수씨 몸까지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기정은 한숨을 쉬며 은수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기정이 애기가 나와서일까?
볼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문득 기정과 별다방 미스정도 틀림 없이 그렇고 그런 사이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오늘 은수씨를 안아보고 나서…….이젠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어요…….기정이한테는……………..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아요…기정이는 내가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니까요….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지금처럼요?”
은수가 희망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급히 되물었다.
“예. 지금처럼요……그냥 기정이 모르게 가끔 이렇게 만나면……………?.”
석채는 은수를 내려다보았다.
잠깐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가는 순간 은수의 입이 열렸다.
“좋……아…………요”
기어들어가는 듯한 작은 소리였지만, 석채는 분명히 들었다.
“약속했어요…분!명!히!”
석채는 소리지르며, 몸을 빙글 돌려 은수의 몸 위에 올라탔다.
입술을 들이대자 은수가 눈을 살포시 감으며 입을 벌렸다.
은수의 음모 아래에 석채가 손을 갖다 대자 조금 전에 샤워를 마쳤는 데도 촉촉히 젖어 있었다.
에어컨 바람을 녹이고도 남을 열기가 다시 방안에 뜨겁게 퍼졌다.
석채는 은수의 등에 자신의 몸을 포갠 채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거워요…그만 내려와요”
은수가 기어들어가는 듯한 말을 뱉자 그제서야 석채는 옆으로 굴러 내려갔다.
자신이 싼 정액이 가슴 곳곳에 묻어있었다.
“이제 우리 어쩌죠?”
은수가 똑바로 누운 석채의 가슴 안쪽으로 파고 들며 작게 속삭였다.
석채는 팔을 은수의 목 아래로 뻗어 안쪽으로 잡아 당겼다.
겨드랑이쪽으로 은수의 꼿꼿이 선 젖꼭지가 느껴졌다.
“후…..우”
석채는 천장을 햔해 한숨을 내 쉬었다.
솔직히 은수가 이 정도로 명기일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자신을 거쳐간 어떤 여자보다도 뜨거운 여자였다.
기정이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젠 죽어도 은수를 포기하기 싫었다.
하지만 오늘 은수는 그저 돈이 필요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몸을 준 것이 아닌가.
석채는 이런 만남이 오늘로 끝나지 않을까 두려웠다.
“우리 오늘처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석채는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저….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은수가 눈을 치켜 뜨고 석채를 올려다 보았다.
석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오늘 나오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건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무척 망설였어요”
석채는 이해한다는 듯 손으로 은수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은수의 살결은 대리석처럼 매끄러웠다.
“제 몸을 주겠다는 생각도 지난 번에….목욕탕에서…………..”
“그 장면요? 하하하”
은수는 입을 삐죽이며 손으로 석채의 가슴을 쳤다.
“어차피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용기를 내봤던 거예요…사실 저………..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남편이 처음이예요”
“………………..”
“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런데 오늘 윤사장님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웠지만, 두 번이나….”
은수는 말을 하다 멈췄다.
부끄러움에 목덜미까지 빨갛게 변해 있었다.
“두 번이나 뭐요?”
석채는 일부러 짖궂게 물었다.
“두 번이나…….오르가즘을 느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예요. 저 자신도 제 몸이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기정이는 잘 안해주나요?”
얼떨결에 말을 뱉어놓고 석채는 움찔했다.
지금 기정이라는 이름을 뱉는다는 것은 잘 달궈진 후라이팬에 모래를 뿌리는 격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남편한테 별 불만은 없었어요…둘 다 애무도 잘 할 줄 몰랐고, 그저 섹스라는 것이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 느낌 없이 했으니까요”
기정이 이름이 나왔어도 의외로 은수는 담담했다.
“그런데 아까 발가락까지………… 발가락까지 빨아줄 때는 온 몸의 잔털까지 다 일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좋았어요?”
“예…”
은수는 다시 낯을 붉혔다.
“이제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예전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나도 그래요. 은수씨”
석채는 앞으로 은수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늘 갑자기 만나자는 것이나,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나, 몸을 주겠다는 것 모두가 내게도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사실 기정이 때문에 은수씨 몸까지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기정은 한숨을 쉬며 은수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기정이 애기가 나와서일까?
볼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문득 기정과 별다방 미스정도 틀림 없이 그렇고 그런 사이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오늘 은수씨를 안아보고 나서…….이젠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어요…….기정이한테는……………..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아요…기정이는 내가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니까요….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지금처럼요?”
은수가 희망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급히 되물었다.
“예. 지금처럼요……그냥 기정이 모르게 가끔 이렇게 만나면……………?.”
석채는 은수를 내려다보았다.
잠깐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가는 순간 은수의 입이 열렸다.
“좋……아…………요”
기어들어가는 듯한 작은 소리였지만, 석채는 분명히 들었다.
“약속했어요…분!명!히!”
석채는 소리지르며, 몸을 빙글 돌려 은수의 몸 위에 올라탔다.
입술을 들이대자 은수가 눈을 살포시 감으며 입을 벌렸다.
은수의 음모 아래에 석채가 손을 갖다 대자 조금 전에 샤워를 마쳤는 데도 촉촉히 젖어 있었다.
에어컨 바람을 녹이고도 남을 열기가 다시 방안에 뜨겁게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