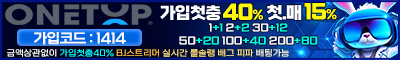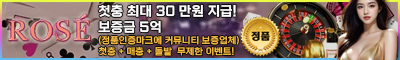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야설 회원투고] 먼동 - 4
꽉 한번 잡아 보고픈 마음은 굴뚝같은데 그러다 일어나면… 안 돼...
이정도로……후~
한참 후, 창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체 천천히 나갔다가 엄마를 크게 부른다.
엄마!~ 어머~ 깜빡 잠 들었나 보네~ 언제 들어왔니?
아~~함~~ 들어 온 것도 몰랐네. 엄마~ 누가 없어 가도 모르겠네.~
아버진 아직 안 왔어~ 말마라~
철물점 박 씨랑 술 먹다 뻗었다고 거기서 그냥 잔다고 김 씨 한 테서 연락 왔더라. 아니~ 아버진 도대체 왜 그런데~ “… ”
엄마는 말없이 묵묵히 저녁을 준비 하러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다.
창수는 요란하게 그릇을 씻어대는 엄마를 의식해 제방에 들어와 누우며 생각을 해보았다.
엄마가 왜 저렇게 요란하게 설거지를 하지... 흠~~
하긴 스트레스 안 받을 레야 안 받을 수 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이지~ 그렇다고 아버지가 좀 도와주기나 하나...
그런데다 힘이나 좋은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창수는 좀 전에 엄마가 몸 빼 하나만 걸쳤다는 생각이 들자 좆이 불끈 거리는걸 느껴 무작정 거실로 나왔다.
설거지를 하는 엄마를 보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엄마도 여자지…
아마도 모르는 체 하실 거야… 그래...
창수는 엄마 뒤로 가서는 슬그머니 엄마의 허리를 껴안으며 효자가 위로 하듯 좌우로 흔들며 말한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래~ 술 깨고 내일 오시면 그때 말씀드려~
화 풀고~~응~~
창수는 엄마를 달래는 말을 하며 의도적이지 않은 것처럼 엄마의 배를 잡고 좆을 밀어붙였다,
찌릿한 전율이 흐른 듯 이~~기~~분,
종숙은 순간 아래 도리에 묵직한 무엇이 다이자 흠칫 놀랬으나 그게 무언지 알았다.
하지만, 아들은 별거 아닌데 자신만 괜히 무안 할까 그대로 두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무게감인지 심장이 벌렁거림을 느껴야 했다.
아래 도리에 전해진 느낌에 점점 설거지 하는 손길은 느려만 가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쾌감에 그대로 그냥 있고만 싶어졌다.
창수는 여전히 엄마의 상체를 좌우로 조금씩 흔들며 연신 말을 한다.
엄마... 화 풀어~~ 응~~ 응~
종숙은 하체에 짓눌리는 아들의 자지가 다이자 허벅에 힘이 들어갔다.
아들의 물음에 종숙은 몸이 원하는 판단을 빠르게 정리하며 아들의 몸을 통해 아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녀석은 지금 발기한 거야… 나도 왠지 몸을 때기가 싫어…
그렇담.. 그렇담… 이대로의 종숙은 그대로 둔 체 태연한 척 입을 연다.
너~ 아버지가 하루 이틀 이래야 말이지~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엄마의 말에 창수는 어떤 안도감을 가지며 빠른 대답의 필요성을 느꼈다.
엄마~ 그래도 요즘은 예전 갖지는 않잖아~
그때 보다야 낮지 안 그래~?
아들의 좆이 점점 선명하게만 느껴져 와 종숙은 아래가 젖어 간다는 걸 느낀다.
그래~ 그때 보다야 낮지~ 그것도 수술 받고서야 나아진 거야~
알기나 해~
의식 하지 않는 엄마의 말투에 창수는 말을 바로 받으며 슬며시 더 깊게 집어넣는다.
아버지도 이제 안 그럴 거야~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야지~ 어떡해~
종숙은 아들의 묵직한 것이 더 밀려들어오자 이젠 거의 자지 러 질 것만 같아온다.
보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었는지 자꾸만 씹 물이 흐르는 것 같다.
흐~~~음.. 좀 더 받아들이고 싶다.
제.. 발 아… 내가 왜이래… 아... 이해했으니까 이만큼 살아 온 거야~
천 날 만날 술에 쪄들어 들어와 봐라~
어느 여자가 붙어 있겠니? 아… 내가… 왜 아… 이 느낌 흐….음……
아들인데… 근데… 이건… 이건… 더 들어왔으면… 좋게.... 아....
창수는 1분 가까이 안고 있다 보니 불안해서 몸을 때며 말을 한다.
그래도 어떡해 엄마~ 여직 살아 왔는데~ 아버진 이제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좆이 빠져 나가자 종숙은 엄청난 허무적인 허탈감이 들며 아랫도리가 허전해져 버렸다.
엄마~ 저녁이나 빨리 줘! 배고파~ 종숙은 밖으로 나가 버린다...
보지는 이미 흥건히 젖어 있는 거 같았다.
종숙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팬티를 꺼내 들었다.
몸 빼 를 내리는 순간 종숙은 까 무라 치 듯 놀랐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세상에… 참... 휴지로 씹 물을 닦아내며 묘한 흥분에 젖어 가는 걸 느껴야 했다.
창수야~~ 밥 먹자~~ 알았어.~ 창수는 화장실에서 급히 자위를 한 뒤 마무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엄마~ 아버지 내일 몇 시에 와~ 글쎄다~ 술 깨면 점심때야 오겠지~
엄마~ 오를 혼자 자려면 심심 하겠다~ 아버지도 없고~
아유~ 없는 게 편해~ 너 아버지 잠이 없어서 꼭 새벽에 잠이 깨서 왔다갔다 잠 다 깨워나~ 왜 너 가 대신 에 미랑 잘 려 고~?
종숙은 무심결에 뱉은 자기 말에 스스로 놀랬다. 그렇지만 더 놀라는 건 왜 그 말에 자기가 놀래야 하는지 그것이 더 놀랍게 느껴졌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마음 이길 레… 후…
창수는 엄마의 그 말에 엄청나게 빠른 흥분을 느끼며 대답했다
알았어. 엄마~ 근데 엄마랑 자본 게 언재야~ 중학교 때인가~
아들 래 미가 같이 잔다는데 내가 왜 이런 기분일까…왜....
아마~ 그때 일 걸~ 녀석~ 밥 더 줘~ 아냐 됐어~…
창수는 방으로와 흥분에 떨며 빨리 시간이 가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땡~~땡~~땡~~땡~~
9시 자명종 소리가 울리며 창수는 얇은 잠옷을 걸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벌써 이불을 펴 놓고 콜드크림을 찍어 발랐다.
엄마~ 이제 잘 건데 그런 거 왜 발라~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자는~
나도 모르겠다.~ 왜 바르는지~ 후~우..
얼마 후,
엄마는 화장을 다 했는지 일어나 형광등을 끄고 자리를 찾아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