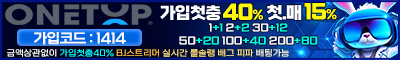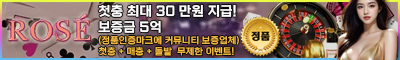보릿고개 - 1부
관리자
기타
0
20036
2018.12.07 16:57
10부작으로 기획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소재와 아이디어가 생기면 추가로 집필 하도록 할께요.
<작가 올림>
================================================================================================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다. 잎사귀가 떨어진 나뭇가지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길가에는 얇은 얼음이
생겼으니까.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주인의 횡포에 많은 시달림을 당해야 했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으로 빈집이 하나 생겼다. 하지만 주인집이 큰 부자였고 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라도 살고 싶었지만 그럴 배짱과 용기가 없었다. 남편과 3명의 아이가 있다.
남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두 다리를 잃고 지금은 자리에만 누워 있다. 지병까지 얻어 더욱 힘든
살림을 하고 있다.
새로 이사한 집. 대문 옆쪽에 위치해 있는 우리집은 쓰러져가는 다른 집보다 좋았다. 비싼 세를 내고 살지만
인심 좋은 마님이 특별히 싸게 주신 집이다.
저녁이 오고 간단한 끼니를 챙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이슬에 온 집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불이 꺼졌나?"
잠결에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보았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장작불을 기대 했으나 추위의 서리에 꺼져버린
불씨만이 나를 반겼다.
"장작도 없는데... 이를 어쩐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주인집 부엌이 생각이 났다. 부엌옆에 있는 창고에는 장작이 가득했으니까.
별생각없이 주인집 부엌으로 발을 향했다. 나도 모르게 뻗쳐지는 나의 두 팔들.
사방을 훌터보며 주인집 장작 몇토막을 가슴에 품었다. 가족이 추울까봐였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집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 살짝 피어있는 불꽃위에 조심히 입을 가져갔다.
"후.. 후..."
짚푸라기 한줌을 손에 쥐고 불이 붙기를 기달렸다.
부엌구석에 장독대가 보였다. 내일 아침에 할 아침밥을 걱정해야 했다.
털컹~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텅빈 항아리. 불연듯 떠오는 주인집 쌀독.
"안돼. 그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생각을 고쳐먹고 나는 그 자리에 다리를 쭈그리고 앉았다.
멍하니 타오르는 아궁이를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용기가 솟아났다.
"한줌만.. 한줌만이야... 딱 한줌만..."
빠른 걸음으로 주인집 부엌에 다달으고 쌀독의 뚜껑을 열었다. 백옥같은 흰 쌀들이 나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아주 유혹적으로...
쌀을 한줌 앞치마에 넣고 나는 불이나케 우리집 부엌으로 달렸다.
그렇게 새벽이 흐르고 아침이 왔다. 밥을 하려고 잠자리에 일어났지만 어제밤에 훔쳐온 쌀로는 한끼도
불가능했다. 더군다가 장작불 역시 거져 있었다.
다시 주인집 부엌 앞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었다. 마음 착한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손짓으로...
"새댁, 이거 가져가."
아주머니는 고구마와 감자를 각각 2개씩 주셨다. 눈물이 났다.
"감.. 사합.. 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고구마와 감자를 익혀먹을 불이 없었다. 다시 주인집 부엌으로 갔다.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만 배외하던 중에 아까 그 착한 아주머니가 나를 뚜러지게 쳐다보았다.
부끄러웠다. 어디든 도망가고 싶었다.
"새댁, 이것도 가져가."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내민 손에는 장작 3개가 쥐어 있었다.
"어떻게 이것을..."
"지금 안가져 가면 오늘은 못가져가. 빨리가져가."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작을 받고 머리를 쪼아리고 부엌으로 달렸다.
아뿔싸... 달리던 중 주인집 대감마님과 마주치고 말았다.
"안.. 녕하세요..."
인사만 불이나케 하고 달려가려는 찰라 대감님이 나를 불렀다.
"이보게. 가슴에 그게 무엇인고?"
"............"
대감마님은 나를 쳐다보며 내 물음을 기달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듯이 뛰었다. 제가 훔친게 아니에요... 훔친게 아니에요...
"이따 점심전에 사랑채로 들거라."
사랑채로 들라는 대감님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무서웠다.
<작가 올림>
================================================================================================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다. 잎사귀가 떨어진 나뭇가지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길가에는 얇은 얼음이
생겼으니까.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주인의 횡포에 많은 시달림을 당해야 했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으로 빈집이 하나 생겼다. 하지만 주인집이 큰 부자였고 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라도 살고 싶었지만 그럴 배짱과 용기가 없었다. 남편과 3명의 아이가 있다.
남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두 다리를 잃고 지금은 자리에만 누워 있다. 지병까지 얻어 더욱 힘든
살림을 하고 있다.
새로 이사한 집. 대문 옆쪽에 위치해 있는 우리집은 쓰러져가는 다른 집보다 좋았다. 비싼 세를 내고 살지만
인심 좋은 마님이 특별히 싸게 주신 집이다.
저녁이 오고 간단한 끼니를 챙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이슬에 온 집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불이 꺼졌나?"
잠결에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보았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장작불을 기대 했으나 추위의 서리에 꺼져버린
불씨만이 나를 반겼다.
"장작도 없는데... 이를 어쩐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주인집 부엌이 생각이 났다. 부엌옆에 있는 창고에는 장작이 가득했으니까.
별생각없이 주인집 부엌으로 발을 향했다. 나도 모르게 뻗쳐지는 나의 두 팔들.
사방을 훌터보며 주인집 장작 몇토막을 가슴에 품었다. 가족이 추울까봐였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집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 살짝 피어있는 불꽃위에 조심히 입을 가져갔다.
"후.. 후..."
짚푸라기 한줌을 손에 쥐고 불이 붙기를 기달렸다.
부엌구석에 장독대가 보였다. 내일 아침에 할 아침밥을 걱정해야 했다.
털컹~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텅빈 항아리. 불연듯 떠오는 주인집 쌀독.
"안돼. 그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생각을 고쳐먹고 나는 그 자리에 다리를 쭈그리고 앉았다.
멍하니 타오르는 아궁이를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용기가 솟아났다.
"한줌만.. 한줌만이야... 딱 한줌만..."
빠른 걸음으로 주인집 부엌에 다달으고 쌀독의 뚜껑을 열었다. 백옥같은 흰 쌀들이 나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아주 유혹적으로...
쌀을 한줌 앞치마에 넣고 나는 불이나케 우리집 부엌으로 달렸다.
그렇게 새벽이 흐르고 아침이 왔다. 밥을 하려고 잠자리에 일어났지만 어제밤에 훔쳐온 쌀로는 한끼도
불가능했다. 더군다가 장작불 역시 거져 있었다.
다시 주인집 부엌 앞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었다. 마음 착한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손짓으로...
"새댁, 이거 가져가."
아주머니는 고구마와 감자를 각각 2개씩 주셨다. 눈물이 났다.
"감.. 사합.. 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고구마와 감자를 익혀먹을 불이 없었다. 다시 주인집 부엌으로 갔다.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만 배외하던 중에 아까 그 착한 아주머니가 나를 뚜러지게 쳐다보았다.
부끄러웠다. 어디든 도망가고 싶었다.
"새댁, 이것도 가져가."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내민 손에는 장작 3개가 쥐어 있었다.
"어떻게 이것을..."
"지금 안가져 가면 오늘은 못가져가. 빨리가져가."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작을 받고 머리를 쪼아리고 부엌으로 달렸다.
아뿔싸... 달리던 중 주인집 대감마님과 마주치고 말았다.
"안.. 녕하세요..."
인사만 불이나케 하고 달려가려는 찰라 대감님이 나를 불렀다.
"이보게. 가슴에 그게 무엇인고?"
"............"
대감마님은 나를 쳐다보며 내 물음을 기달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듯이 뛰었다. 제가 훔친게 아니에요... 훔친게 아니에요...
"이따 점심전에 사랑채로 들거라."
사랑채로 들라는 대감님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무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