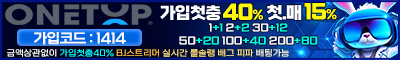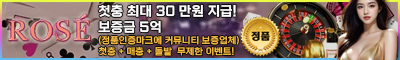보릿고개 - 2부
관리자
기타
0
12190
2018.12.07 16:57
고구마와 감자가 익어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교차 하였다.
"대감님한테 나는 도둑년으로 오인받고 있을꺼야..."
손에 잡힌 나뭇가지를 화로에 집어 넣고 뒤척이며 두려움과 이런 저런 생각을 하였다.
"대감님한테 가서 혼나는 건가..."
아침을 해먹고 막내을 재우고 신랑도 잠들었다. 둘째와 첫째는 소학교로 등교했다.
뭐랄까. 그냥 평온과 고요? 어떤걸 선택 할지도 몰랐다.
해가 점점 점심시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대감님이 불러 사랑채로 가야 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긴장해서 인가...
어렵게 도착한 사랑채 앞. 입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다.
대감님... 정말 부르기 힘든 말이 였지만 들어가야 했다. 가볍게 대감님을 불러보았다.
"대감... 님..."
방안에서 낮은 헛기침소리가 들리며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귓구멍을 막고 싶었지만 두주먹을 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드르륵... 방문을 열고 구멍난 버선을 방안으로 들이밀었다.
"부르셨어요."
"거기 앉거라."
그렇게 무릎을 꿀고 앉아 한참을 있었던거 같다. 대감님은 책을 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에헴."
헛기침만을 할뿐이였다. 대감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은 먹었더냐."
"예...."
"무엇을 먹었더냐?"
"고구마와 감자를 먹었습니다."
"양이 차드냐."
"............"
"배가 고팠느냐."
"............"
대감님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소리만 들릴뿐...
책장을 한장 넘기시더니 나를 째려보신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고?"
나이를 묻는 질문에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주 작게...
"뭐라고? 내가 귀가 막혔나?"
"서른넷이어요..."
내 나이를 듣고 대감님이 책이 올려져 있는 탁자를 옆으로 치우시더니 나를 쳐다보신다.
"이 방이 따뜻하느냐."
"네?"
"이방이 따뜻하냐고 묻지 않느냐."
"아... 예..."
갑자기 방이 따뜻하냐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혼나는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안심이 되는 순간이였다.
고개를 들어 대감님을 봤는데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이리와서 앉거라."
"............."
이리오라니? 어디로 말인가...
"내 옆으로 와서 앉으란 말이다."
갑자기 무서웠다. 옆에 앉으란 말에 나는 입고 있떤 저고리의 고름을 한손으로 꼭 붙들었다.
"아닙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간단한 거부였지만 왕강한 거부의 표현이기도 했다.
"어허~ 이리오래도."
대감님의 호통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손을 잡고 자신의 품으로 나를 품었다. 놀라서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대... 대.. 감님...!"
"니가 나를 알것이다. 내가 자손이 없어 고민하는 것도 알것이다. 나를 도와준다면 쌀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장작을 주겠다."
호의는 고마웠으나 지금 이순간이 나는 너무 무서웠다.
"왜이러셔와요..."
나를 품에 품으시고는 한손으로 나의 허벅지를 잡아당겼다. 부끄러운 포즈였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고? 하나 더 낳아주지 않으련?"
"소인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대감님의 순아귀를 소리치듯 빠져나왔다. 두손으로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는 치마를 내리고 저고리를 쥐어
잡았다.
"대감님, 저는 씨받이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보내주셔요."
"너에게 쌀과 불을 준다 하지 않더냐."
대감님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고 싶었다. 나에게는 지아비가 있고 자식이 있다.
"나의 마음을 해아려주거라."
대감님이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옴겨 빌듯이 말하였다.
"쌀과... 불..."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 마음이... 조금씩...
"아..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셔요!"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미친듯이 쏫아지는 눈물을 주체 할 수 없었다.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사랑채에서 뛰쳐 나왔다. 서러움에 눈물이고 두려움과 무서움의 눈물이였다.
그날밤...
가족을 재우고 나는 우리집 부엌에 혼로 앉아 아궁이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다.
부엌 밖으로 보이는 달이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다. 보름달인가... 둥근 달이 마치 옥구슬과 같이 아름다웠다.
아침에 있었던 대감님과의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허벅지 사이로 뭔가가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이 저리되고 10년째 이밤을 지새고 있어. 여자로서 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면서..."
대감님의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해봤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했다.
살과 살이 닺는 순간 따뜻함의 온기를 느끼고 부드러운 살갓에 녹아드는 기분이랄까...
사랑채쪽을 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직 안주무시는건가...?"
대감님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한발 한발 향하게 했다.
늦은 밤이라 소리내어 대감님을 부를 순 없었다. 사람이라도 나오면 나는 불륜을 저지른 천하의 못된년이
되고 말테니까.
어슬렁 거리는 나의 귓가에 대감님의 소리가 살포시 들려왔다.
"밖에 누구더냐?"
나는 그 목소리에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그자리에 서서 사랑채 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누구냐고 묻지 않더냐."
고민을 하다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빨리 우리집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내가 발걸음을 돌리고 달려가고 있을 때쯤 사랑채의 문이 반쯤 열리고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감님은...
집으로 와서 나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대감님과의 밀애를 상상하고 있었다.
걱정이 들었다. 내일 아침에 대한 아련한 고민을...
"대감님한테 나는 도둑년으로 오인받고 있을꺼야..."
손에 잡힌 나뭇가지를 화로에 집어 넣고 뒤척이며 두려움과 이런 저런 생각을 하였다.
"대감님한테 가서 혼나는 건가..."
아침을 해먹고 막내을 재우고 신랑도 잠들었다. 둘째와 첫째는 소학교로 등교했다.
뭐랄까. 그냥 평온과 고요? 어떤걸 선택 할지도 몰랐다.
해가 점점 점심시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대감님이 불러 사랑채로 가야 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긴장해서 인가...
어렵게 도착한 사랑채 앞. 입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다.
대감님... 정말 부르기 힘든 말이 였지만 들어가야 했다. 가볍게 대감님을 불러보았다.
"대감... 님..."
방안에서 낮은 헛기침소리가 들리며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귓구멍을 막고 싶었지만 두주먹을 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드르륵... 방문을 열고 구멍난 버선을 방안으로 들이밀었다.
"부르셨어요."
"거기 앉거라."
그렇게 무릎을 꿀고 앉아 한참을 있었던거 같다. 대감님은 책을 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에헴."
헛기침만을 할뿐이였다. 대감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은 먹었더냐."
"예...."
"무엇을 먹었더냐?"
"고구마와 감자를 먹었습니다."
"양이 차드냐."
"............"
"배가 고팠느냐."
"............"
대감님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소리만 들릴뿐...
책장을 한장 넘기시더니 나를 째려보신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고?"
나이를 묻는 질문에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주 작게...
"뭐라고? 내가 귀가 막혔나?"
"서른넷이어요..."
내 나이를 듣고 대감님이 책이 올려져 있는 탁자를 옆으로 치우시더니 나를 쳐다보신다.
"이 방이 따뜻하느냐."
"네?"
"이방이 따뜻하냐고 묻지 않느냐."
"아... 예..."
갑자기 방이 따뜻하냐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혼나는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안심이 되는 순간이였다.
고개를 들어 대감님을 봤는데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이리와서 앉거라."
"............."
이리오라니? 어디로 말인가...
"내 옆으로 와서 앉으란 말이다."
갑자기 무서웠다. 옆에 앉으란 말에 나는 입고 있떤 저고리의 고름을 한손으로 꼭 붙들었다.
"아닙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간단한 거부였지만 왕강한 거부의 표현이기도 했다.
"어허~ 이리오래도."
대감님의 호통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손을 잡고 자신의 품으로 나를 품었다. 놀라서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대... 대.. 감님...!"
"니가 나를 알것이다. 내가 자손이 없어 고민하는 것도 알것이다. 나를 도와준다면 쌀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장작을 주겠다."
호의는 고마웠으나 지금 이순간이 나는 너무 무서웠다.
"왜이러셔와요..."
나를 품에 품으시고는 한손으로 나의 허벅지를 잡아당겼다. 부끄러운 포즈였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고? 하나 더 낳아주지 않으련?"
"소인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대감님의 순아귀를 소리치듯 빠져나왔다. 두손으로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는 치마를 내리고 저고리를 쥐어
잡았다.
"대감님, 저는 씨받이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보내주셔요."
"너에게 쌀과 불을 준다 하지 않더냐."
대감님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고 싶었다. 나에게는 지아비가 있고 자식이 있다.
"나의 마음을 해아려주거라."
대감님이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옴겨 빌듯이 말하였다.
"쌀과... 불..."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 마음이... 조금씩...
"아..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셔요!"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미친듯이 쏫아지는 눈물을 주체 할 수 없었다.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사랑채에서 뛰쳐 나왔다. 서러움에 눈물이고 두려움과 무서움의 눈물이였다.
그날밤...
가족을 재우고 나는 우리집 부엌에 혼로 앉아 아궁이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다.
부엌 밖으로 보이는 달이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다. 보름달인가... 둥근 달이 마치 옥구슬과 같이 아름다웠다.
아침에 있었던 대감님과의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허벅지 사이로 뭔가가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이 저리되고 10년째 이밤을 지새고 있어. 여자로서 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면서..."
대감님의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해봤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했다.
살과 살이 닺는 순간 따뜻함의 온기를 느끼고 부드러운 살갓에 녹아드는 기분이랄까...
사랑채쪽을 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직 안주무시는건가...?"
대감님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한발 한발 향하게 했다.
늦은 밤이라 소리내어 대감님을 부를 순 없었다. 사람이라도 나오면 나는 불륜을 저지른 천하의 못된년이
되고 말테니까.
어슬렁 거리는 나의 귓가에 대감님의 소리가 살포시 들려왔다.
"밖에 누구더냐?"
나는 그 목소리에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그자리에 서서 사랑채 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누구냐고 묻지 않더냐."
고민을 하다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빨리 우리집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내가 발걸음을 돌리고 달려가고 있을 때쯤 사랑채의 문이 반쯤 열리고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감님은...
집으로 와서 나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대감님과의 밀애를 상상하고 있었다.
걱정이 들었다. 내일 아침에 대한 아련한 고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