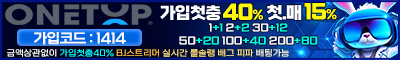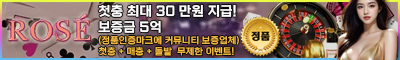보릿고개 - 4부
관리자
기타
0
9993
2018.12.07 16:57
힘 없는 발걸음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막내가 하루종일 나무인형을 가지고 논 모양이다. 신랑의 기저귀를 갈 시간이 되었다는걸 알 수 있었다.
"요즘 왜 이렇게 돌아다녀?"
신랑이 물었다. 대답을 못하겠더라...
"힘들지?"
"......."
"말을해야 알지. 이런 내가 있으니 당연지사겠지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만 보고 살잖아요."
"이런 병신같은 나를?"
남편의 말이 나를 더욱 속상하게 만들었다. 나의 지아비다. 내 평생 몸바쳐야 할 지아비다.
"오늘도 점심과 저녁이 힘들거 같아요."
"밭에서 일 안했어?"
"오늘은 일거리가 없다고 그냥 쉬라네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지. 여보."
남편의 말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것 같았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거 처럼 보였다.
남편은 내가 자신때문에 우는줄알고 같이 괴로운 표정이였다. 이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나는 세숫대아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부엌에서 한없이 울고 싶었다. 가족에게 배신을 시켰으니... 그것도 남편에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방안에서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프단다.
"앙앙앙... 배고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을 꼬... 무능한 내 책임이지.
"오늘밤만 자면 내일 아침은 흰쌀밥 해줄께. 그만 울자."
"진짜? 쌀밥주는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만 울자."
아이들이 신나했다. 나도 참 어이가 없었다. 쌀이라니...
"당신도 피곤하실텐데 어서 주무세요."
"피곤할께 뭐 있어. 하루종일 방구석에서 누워만 있는데."
"........"
가족들을 제우고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쌀독을 봤지만 다음날 먹을 피조차도 없었다.
"어쩐다.. 아침에 아주머니가 이제 고구마도 못주신다고 했는데..."
다시 주인집 부엌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밖에서 기웃거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였다.
"거기 언넘이냐?"
누군가 내가 부엌에서 기웃거리는 행태를 본 모양이였다. 나는 놀라 몸을 장독대 뒤로 숨겼다.
"언넘이냐고 묻지 않더냐?"
"이 목소리는... 대감님?"
달빛에 보이는 남정네의 모습이 대감님과 비슷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어만 있었다.
"거기 장독대 뒤에 숨어 있는 넘이 누구더냐?"
내가 장독대 뒤에 숨는걸 보신 모양이다. 큰일이였다.
"셋을 셀터이니 냉큼나오거라. 안그러면..."
대감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 섰다.
"아니... 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님은 나를 뚜러져라 쳐다보셨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이곳은 왜 왔느냐?"
".............."
대감님은 출타하셨다가 들어오시면서 나를 보신 모양이였다. 술냄새가 풍겼다.
"저...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도둑이 든지 알고..."
말도 안돼는 핑계를 지어냈다.
"도둑?"
"예...."
순간 아차 싶었다. 내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순간 대감님이 호탕하신 목소리로 웃음을 짓고 계셨다.
"하하하하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다.
대감님이 나에게 한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도둑인지 알고 이 오밤중에 남자들도 없는 곳에 여자가 혼자 왔다?"
"..........."
"그 도둑이 나인게로군."
큰 죄를 진것 같았다. 이놈에 입이 방정이였다.
"그렇다면 니가 도둑을 잡은게로구나?"
"예?"
"오냐. 그럼 내 큰 상을 주겠다."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그저 어리둥절 할 뿐이였다.
"내 너에게 쌀 한가마를 주겠다."
허... 한가마... 쌀을... 너무 좋았지만 표현을 할 수 없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감... 감사 합니다. 대감님."
"그럼 도둑을 잡았으니 나와 함께 사랑채에서 술한잔 하자구나."
대감님의 말씀을 거절 할 수 없었다. 사랑채로 대감님의 뒤를 쫒아 걸어가면서 내일 먹을 쌀을 받았다는
기분에 콧노래가 나올 지경으로 좋았다.
"내 먼저 들어가 있을 터이니 안주거리와 앞뜰에 있는 막걸리통에서 술을 받아 오거라."
"예, 대감님."
너무 기뻤다. 쌀을 받았으니까. 단숨에 안주거리와 막걸리를 주전자에 받아 상을 차리고 사랑채로 들었다.
사랑채 안에서는 대감님이 늦은 시간인데도 책을 펴고 앉아 계셨다.
"이리 앉거라."
방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에 있던 대감님과의 기억이 떠올라 부끄러웠지만 이상한 감이 감지되었다.
"나... 대감님과 할 수도 있어..."
이런 나혼자만의 생각을 갖으며 사랑채의 따뜻한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막내가 하루종일 나무인형을 가지고 논 모양이다. 신랑의 기저귀를 갈 시간이 되었다는걸 알 수 있었다.
"요즘 왜 이렇게 돌아다녀?"
신랑이 물었다. 대답을 못하겠더라...
"힘들지?"
"......."
"말을해야 알지. 이런 내가 있으니 당연지사겠지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만 보고 살잖아요."
"이런 병신같은 나를?"
남편의 말이 나를 더욱 속상하게 만들었다. 나의 지아비다. 내 평생 몸바쳐야 할 지아비다.
"오늘도 점심과 저녁이 힘들거 같아요."
"밭에서 일 안했어?"
"오늘은 일거리가 없다고 그냥 쉬라네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지. 여보."
남편의 말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것 같았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거 처럼 보였다.
남편은 내가 자신때문에 우는줄알고 같이 괴로운 표정이였다. 이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나는 세숫대아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부엌에서 한없이 울고 싶었다. 가족에게 배신을 시켰으니... 그것도 남편에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방안에서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프단다.
"앙앙앙... 배고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을 꼬... 무능한 내 책임이지.
"오늘밤만 자면 내일 아침은 흰쌀밥 해줄께. 그만 울자."
"진짜? 쌀밥주는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만 울자."
아이들이 신나했다. 나도 참 어이가 없었다. 쌀이라니...
"당신도 피곤하실텐데 어서 주무세요."
"피곤할께 뭐 있어. 하루종일 방구석에서 누워만 있는데."
"........"
가족들을 제우고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쌀독을 봤지만 다음날 먹을 피조차도 없었다.
"어쩐다.. 아침에 아주머니가 이제 고구마도 못주신다고 했는데..."
다시 주인집 부엌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밖에서 기웃거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였다.
"거기 언넘이냐?"
누군가 내가 부엌에서 기웃거리는 행태를 본 모양이였다. 나는 놀라 몸을 장독대 뒤로 숨겼다.
"언넘이냐고 묻지 않더냐?"
"이 목소리는... 대감님?"
달빛에 보이는 남정네의 모습이 대감님과 비슷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어만 있었다.
"거기 장독대 뒤에 숨어 있는 넘이 누구더냐?"
내가 장독대 뒤에 숨는걸 보신 모양이다. 큰일이였다.
"셋을 셀터이니 냉큼나오거라. 안그러면..."
대감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 섰다.
"아니... 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님은 나를 뚜러져라 쳐다보셨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이곳은 왜 왔느냐?"
".............."
대감님은 출타하셨다가 들어오시면서 나를 보신 모양이였다. 술냄새가 풍겼다.
"저...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도둑이 든지 알고..."
말도 안돼는 핑계를 지어냈다.
"도둑?"
"예...."
순간 아차 싶었다. 내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순간 대감님이 호탕하신 목소리로 웃음을 짓고 계셨다.
"하하하하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다.
대감님이 나에게 한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도둑인지 알고 이 오밤중에 남자들도 없는 곳에 여자가 혼자 왔다?"
"..........."
"그 도둑이 나인게로군."
큰 죄를 진것 같았다. 이놈에 입이 방정이였다.
"그렇다면 니가 도둑을 잡은게로구나?"
"예?"
"오냐. 그럼 내 큰 상을 주겠다."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그저 어리둥절 할 뿐이였다.
"내 너에게 쌀 한가마를 주겠다."
허... 한가마... 쌀을... 너무 좋았지만 표현을 할 수 없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감... 감사 합니다. 대감님."
"그럼 도둑을 잡았으니 나와 함께 사랑채에서 술한잔 하자구나."
대감님의 말씀을 거절 할 수 없었다. 사랑채로 대감님의 뒤를 쫒아 걸어가면서 내일 먹을 쌀을 받았다는
기분에 콧노래가 나올 지경으로 좋았다.
"내 먼저 들어가 있을 터이니 안주거리와 앞뜰에 있는 막걸리통에서 술을 받아 오거라."
"예, 대감님."
너무 기뻤다. 쌀을 받았으니까. 단숨에 안주거리와 막걸리를 주전자에 받아 상을 차리고 사랑채로 들었다.
사랑채 안에서는 대감님이 늦은 시간인데도 책을 펴고 앉아 계셨다.
"이리 앉거라."
방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에 있던 대감님과의 기억이 떠올라 부끄러웠지만 이상한 감이 감지되었다.
"나... 대감님과 할 수도 있어..."
이런 나혼자만의 생각을 갖으며 사랑채의 따뜻한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