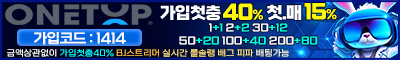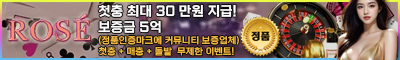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야설 회원투고] 먼동 - 10
죄책감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엄마와의 합의 같은 대화를 한 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다만, 아까 아버지를 잠깐 보면서 마음속에 좀 찔리는 걸 느꼈지만 그렇게 절절하지는 않았다.
문득 어젯밤을 생각하며 연기를 뱉어낸다.
후~~우~~ 그래~~ 아직도 엄마는 여자 이였어.~
쓸쓸 그 생각이 들며 어젯밤 엄마의 신음과 몸 짖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거의 사라져서 그런지 좆이 벌떡이는 걸 느낀다.
그래… 엄마도… 어젯밤… 괭 장이 좋아했어.…… 아… 그 보지…
그래… 내가… 앞으로… 얼마든지…먹을 수 있어…
엄마도… 하고 싶었겠지… 여잔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힘이나 있어…
욕정을 해소 할 때도 없었으니 그렇게 자위도 했겠지...?
창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그렇게 괴로워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 떡 게 한 번 더 라는 생각을 갖고 엄마를 기다렸다.
오면 막사로 들어가 그냥 안아 버릴까… 엄마가 어떻게 나올까…
어제일도 아직.. 남았는데… 아냐… 그냥 모르는 척… 삽질할 때…
엉덩이에 내 좆을 한번 대볼까… 아냐 그건 너무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냥 엄마를 사랑하니 앞으로 아버지 몰래 하자 그래볼까…
아냐… 그래 좋아할 엄마가 어 딧어… 아~… 왜 이리 생각이 안 나냐…
아.. …난.. 진짜… 난, 돌이야… 좆도
얼마 후, 엄마가 왔고 창수는 생각과 달리 삽질만 부지런히 해대었다.
엄마도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창수는 허리를 피며 엄마를 본다.
삽질하는 엄마의 튼실한 엉덩이에 눈이 쏠리며 내가 어제 저 엉덩이를 주물렀다는 생각이 들자 좆이 불어옴을 느낀다.
분명… 엄마도… 하고… 싶었을 거야… 다만… 아들이라… 말은 못하고...
그렇지... 한번이나… 두 번이나… 뭐.. 다를 게 있어… 아~
좋은 생각.. 없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뾰족한 수 가 없었다.
그때 창수는 문득 막사 옆 작은방이 생각이 났다.
그 방은 양계 도둑들이 한참 극성일 때 아버지가 지킨다고 만들어 놓은 방이다.
그래... 거기면 뭔가 되지 않을까…
엄마 막사 골방 미리 치워 놓아야 되지 않아~ 글쎄다~ 어쩔까~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여기 다 끝난 거 같은데 할 거 없잖아~
내가 마무리 할게 엄마가 대충 치워~ 온 김에 해 버리지 뭐~
그래~ 그럼~그럴까~…
엄마는 삽을 내게 주시며 문을 열고 나갔다. 그래 어떻게 될 거야~~
온갖 음란한 생각이 다 들며 좆이 점점 뻗어 나가는 걸 느낀다.
후~~~
엄마를 보낸 후 창수는 대충 정리를 하며 어떡해야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뚜 렸 한 해답은 없었다.
에이~ 그래 일단 가보는 거야~ 엄마 다 치워가요~
응~ 그래 두어 달 안 썼다고 방이 말이 아니네~ 어휴 이 먼지 좀 봐~
엄마는 한 평 남짓한 방안을 부지런히 닦아가며 걸레질을 해댄다.
창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다 그냥 엉덩이만 방바닥에 붙인 채 담배를 피며 엄마의 커다란 엉덩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 저 엉덩이에 한 번 더 시원하게 박아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음란한 상상을 해서인지 좆이 빠르게 팽창함을 느끼며 창수는 어떡하던 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져 온다.
하~ 뭐라 말하지~ 뭔~ 마땅한 말이 있어야지~
한참을 걸레질 하던 엄마는 요 정도로 대충 치우고 사용할 때 한번 훔치면 되겠다며 나가려는지 네게로 걸어온다.
하~ … 뭐라 그러 냐~
엄마는 장화를 신으려는지 내 옆에 앉아서는 장화 한 짝을 들다 나를 보더니 이제 가자 그런다.
난 무슨 마음에서 이였는지 잡으려는 급한 마음에 엄마~ 그냥 좀 더 여기 같이 있다가 가면 안 돼~?
아들 래 미 의 그 말에 종숙은 무슨 소린가 했으나 곧 가슴이 철렁 이는걸 느낄 수 있었다.
의지와 달리 심장은 뜀박질을 하 기 시작한다.
왜~ 아니 ~ 그냥 여태 막사 정리하고~ 했으니 좀 쉬었다 가자고~~
아들의 말을 들으며 종숙은 왜 그리 흥분이 되는지 몰랐다.
자신 역시 바라고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래~ 그럼 좀 쉬었다 가자~ 가봐야 할일 도 없고~~
엄마를 잡아 놓자 창수는 어떤 안도감과 함께 좆이 빠르게 팽창 하였다.
이제 어떡하나 오로지 그 생각만 들 뿐이었다.
종숙은 그 미묘한 분위기와 상상에 점점 씹 물이 베어 나오는 걸 느끼나 남편에 대한 별다른 가책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어젯밤, 아들의 그 굵고 우람한 좆만 생각나면서 몸이 점점 데워져 갔다.
그래 한번이나 두 번이나 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인석 성격에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들을 슬쩍 보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고 미기 적 거리는 모습이 역역했다.
그래 인석은 에 미랑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런 확인을 하고 나니 종숙은 점점 보지가 꼴렸고 그때 까지도 말을 못하는 아들을 보며 애간장을 태웠다.
종숙은 한참을 기다리다 입을 열었다,
창수야~ 집에 가봐야 오늘은 할일도 별로 없는데 에 미랑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엄마의 그 말에 창수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엄마를 보며 말한다.
엄마~ 진짜~ ?
들뜬 아들의 얼굴을 보며 종숙은 이제 한 치의 가책 없이 결심을 해버린다.
그래, 내가 생과부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수절 했으면 됐지…
그렇다고 열녀문을 세울 것도 아닌데 그래 한번이나 두 번이나 다 똑같은 거야… 둘만 말 안하면 되… 그래… 이젠 몰라…
창수는 엄마가 대답대신 고개를 끄떡이며 자신을 보자 무얼 말하는지 알 수 있어 몸을 돌려 엄마를 안으니 엄마는 급하게 제지를 한다.
안 돼 여기선 창문도 있고 문도 못 잠그잖아~~
여기선 안 되고 얼른 일어나~~
엄마는 막사로 가자며 말하곤 나가셨고 창수는 바로 뒤따라 나갔다,
문을 열고는 다시 닫아 버리니 빵 구 난 카펫 속으로 몇 줄기 빛만이 침침한 막사에 윤곽을 그려준다.
엄마는 먼저 창고 끝으로 가더니 쌀겨를 보관하는 두 평 남짓한 곳으로 들어간다.
창수도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며 엄마를 보았다.,
종숙은 심장이 떨리며 아들과 침침한 곳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할 생각을 하니 보지가 꼴려 미칠 지경이다.
엄마가 나에게 보지를 대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만으로도 난 미칠 것만 같다.
창수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좆을 몸 빼 에 밀어붙였다.
안 그래도 꼴려있는 보지에 고구마 같은 큰 좆아 박혀드니 종숙은 미칠 것 같았다..
악 하~~학.. 항... 음~~아..... 악......
창수는 몸을 낮춰 엄마의 보지에 좆을 완전 밀착한 체 엉덩이를 당기니 엄마는 신음이 점점 커져간다.
흐음… 아아 아 아… 하.. 아… 아…
종숙은 이제 거의 자지러질 것 같아 아들을 살짝 밀고는 팬티와 몸 빼 를 종아리 까지 내려버렸다.
엄마가 옷을 내리는걸 보며 창수도 같이 벗고는 엄마를 기다렸다.
종숙은 일어나다 아들의 시뻘건 우람한 자지가 눈에 들어오자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저 크고 딱딱한 것이 보지를 쑤셔 댈 거라 생각하니...
보지가 벌렁거려 미칠 지경이었다.
창수는 장소를 보니 깔만한 것도 없고 엄마를 보며 엄마~ 깔게 없는데..
저~ 뒤로 돌면 안 돼~
뒤에서 박아대겠다는 아들의 그 말이 침침한 창고만큼이나 묘하게 들려오며 흥분이 되었다.
엄마는 얼른 아들의 좆을 받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