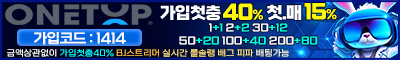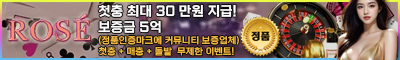어머님전상서2 - 1부
관리자
근친
0
7465
2018.12.23 14:01
" 퍽퍽퍽 아학 아학------"
깊은 창모자를 눌러쓴 사내는 연실 엄마의 엉덩이를 쳐대고 있었다.
" 좀더---------아 조아"
엄마의 탄성은 계속 됐고, 사낸 연실 방아만 찧어대고 있었다.
" 존나게 땡겨대네 씨부럴년"
" 아욱 헉헉 아저씨도 넘 조아-----"
엄마는 사내의 얼굴을 뒤돌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 이제부터 니 서방한테 주지마------"
" 이제 니 보진 내꺼여-----"
사내의 움직임은 계속 됐고 엄마는 그러때 마다 알 수없는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한참을 이름모를 사내와 몸을 섞던 엄마는 그제서야 날 쳐다본다.
" 민수야------"
난 부엌 입구에 서 있었고 사내와 엄마는 부엌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방아를 찧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순간 도망칠까도 생각했는데 어리나이엿지만 엄마와 아저씨의 다음 행동이 무척 궁금했다.
" 빼---- 얘가 보잖아--------"
엄마의 엉덩이가 잠시 요동치며 움직이는가 싶더니
" 좀만 좀만 좀만 ----- 나온다 나온다 욱욱욱------"
엄마는 내가 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사내의 몸에서 떨어졌다.
사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난 어른 좇을 첨으로 보았다.
시커멓고 굵은 좇대가 마치 앞산에 난 송이버섯 마냥 흉칙스럽다.
" 민수야 배고프지 엄마가 점심 얼른 체려 줄께"
엄마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머리와 옷매무새를 어루만지며 수돗가로 쫒기듯 사라진다.
" 짜식 똘망하게 생겼네---------공부잘해라 -----"
사내는 오백원짜리 지폐를 한장 주면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을 나선다.
사내의 어깨엔 제비문양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사내가 썻던 모자 속에서도 제비가 그려져 있었다.
사내 또한 쫒기듯 대문에서 사라져간다.
난 수돗가 여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근데 엄마가 치마를 허리까지 들추고는 사타구니 속을 비벼대며 씻고 있었다.
어렴풋이나마 엄마의 보지를 첨으로 본 것이다.
"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때당시 엄마의 히멀건 속살을 봤다는 설레임보단 제비문양의 모자를 눌러쓴 사내의 정체가 더욱 궁금했다.
"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우체부아저씨가 엄마 치료해주고 나가신거야"
" 근데 왜 발가벗고 치료해?-----"
" 그건--------"
" 민수야 너 오늘 본거 아빠한테 아니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돼 알았지?"
" 왜?------"
" 그럼 엄마 죽어"
" 왜 우체부 아저씨가 치료 안해줘서?-----"
" 그래 민수가 다른사람한테 얘기하면 우체부 아저씨가 다신 엄마 치료 안해주신데------"
그날 엄마는 왜 발가벗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았다.
물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는 됏지만----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드러가기 전인건 확실한데 언제쩍인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날 엄마와 우체부 아저씨와의 정사 장면은 어린 나에게는 무척 충격적이였나 보다.
내 어릴적 기억속에서 생각나는거라곤 엄마와 우체부아저씨와의 격정적인 씹질 이외에는 생각나는게 없다.
며칠후
" 엄마 우체부 아저씨 이제 안와?"
난 마루에 걸터 앉아 파를 다듬던 엄마를 올려다보며 얘길 꺼낸다.
물론 엄마와 나 둘뿐이엿다.
내가 다른사람에게 얘기하면 정말로 엄마가 죽는줄로만 알았다.
" 오실꺼야-------"
" 엄마 근데 마니 치료해야돼?"
" 그래 아주 마니 --------"
" 그러다 다른 사람이 보면 엄마 죽을지도 모르잖아?"
-----------------
그때 창모자를 눌러쓴 우체부가 대문을 열고 드러온다.
얼굴에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넘고 있었다.
" 안녕하세요-----"
기분은 나빴지만 어떻하랴 엄마를 치료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신데…
" 아저씨 엄마 빨랑 낳게 해주세요 ----네"
난 천진한 눈빛으로 아저씨를 존경스럽게 쳐다본다.
" 얘 뭔소리 하는겨?"
아저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게로 다가선다.
" 민수야 어여 나가 놀아 ---- 어여"
엄마는 손을 휘휘 젓고 있었다.
" 엄마 나 치료하는거 구경하면 안돼?"
" 안돼 큰일나 엄마 죽어------"
" 에씨 보고 싶은데------"
난 궁시렁거리며 대문을 나왔으나 궁금한건 어쩔수 없었던 모양이다.
몰래 다시 대문을 드러간다.
아저씨는 엄마의 궁둥이를 토닥거리며 안방으로 드러서고 있었다.
에씨 부엌에서 치료하지---- 그럼 몰래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소리라도 들을 요량으로 안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에 귀를 귀울인다.
" 아 씨발 빨리좀 벗어 존나 하고 싶어 미치겟어"
" 이사람 우물에 가서 숭늉 찾을 사람이네-----"
" 아 진짜 밍기적 그럴껴?"
" 그럼 그 모자라도 벗어요 ---- 땀도 안나나봐"
" 알았어 알았으니깐 팬티 마저 벗어"
" 창피한데-----"
" 미친년 오늘따라 별스럽게 지랄해대네------"
" 자 돌아봐 내가 벗겨 줄께"
" 아파요 좀 살살-----"
" 으메 으메----- 좋은겨"
" 철퍼덕 척척 철퍼덕 척척"
살과 살이 맞부딯히며 내는 마찰음이 귓가에 들려온다.
그러더니 그날 들었던 엄마의 탄성이 또다시 들러오기 시작하고 있다.
" 음-----음----악"
가끔 엄만 외마디 비명을 토해 놓는다.
치료가 무진장 아픈가 보다.
난 눈에서 눈물을 글썽거린다.
저러다 엄마가 죽은면 얼케하나-----
참으려 참으려 했지만 엄마의 계속되는 비명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엇다.
" 아저씨 살살 해요 엄마 죽어요"
난 마루에 털버덕 주저 앉아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다.
" 이게 뭔소리여?"
" 아 씨발 아들래미 아냐?"
그리곤 뭔가 부시럭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안방문이 덜커덩 열린다.
" 엄마"
엄마가 예전과 같이 머리며 옷매무새를 어루만지면서 방을 나서고 있었다.
난 무작정 엄마에게로 가 안겼다.
" 엄마 죽지마 엄마야------"
난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신나게 울엇다.
" 민수야 울지마 울지마----- 엄마 안죽어"
그때 느꼈던 엄마의 가슴은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따뜻했다.
" 너 자꾸 그러면 아저씨 다신 안올껴"
우체부 아저씨가 가방을 짚어 메고 방문을 나선며 나를 쏘아 붙인다.
" 엉어어어어어엉"
난 그때까지 울음이 멈춰지지 않는다.
" 아주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퉷"
우체부 아저씨는 성난 목소리를 해대며 대문을 나선다.
난 그렇게 엄마의 가슴에 안겨 조용히 잠이 든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잠꼬대를 해대며 잠을 잔 모양이다.
" 엄마 죽지마 엄마야 죽지마라------"
날 누군가 툭툭치는 느낌으로 잠에서 깬다.
" 낼모래 핵교 갈 놈이 아직까지 엄마 타령이냐?"
아빠였다.
" 빨랑가서 막거리 한되박이나 받아와"
" 아씨 아빤 알지도 못하면서------"
" 임마 아빠가 뭘모른다는 거야 "
맞다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 아냐 암것도------"
" 너 아빠 심부름 안할려고 잔꾀부리다간 아빠한테 정말로 혼난다."
" 빨랑가서 막걸리나 받아와 -----"
" 알았어"
난 양은 주전자를 찾으려 부엌문을 열고 드러선다.
엄마는 무엇에라도 놀란거마냥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 엄마 나 아빠한테 얘기 안했어"
난 조그만 소리로 엄마를 안심시킨다.
" 아고 내새끼 넘 착한 내새끼"
엄마는 나의 엉덩이를 톡톡톡 두드려 주신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나으셔야 될텐데…
난 막걸리를 받으러 가면서 달님에게 기도한다.
" 하느님 하느님 우리엄마 빨랑 낫게 해주세요 ---- 네"
깊은 창모자를 눌러쓴 사내는 연실 엄마의 엉덩이를 쳐대고 있었다.
" 좀더---------아 조아"
엄마의 탄성은 계속 됐고, 사낸 연실 방아만 찧어대고 있었다.
" 존나게 땡겨대네 씨부럴년"
" 아욱 헉헉 아저씨도 넘 조아-----"
엄마는 사내의 얼굴을 뒤돌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 이제부터 니 서방한테 주지마------"
" 이제 니 보진 내꺼여-----"
사내의 움직임은 계속 됐고 엄마는 그러때 마다 알 수없는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한참을 이름모를 사내와 몸을 섞던 엄마는 그제서야 날 쳐다본다.
" 민수야------"
난 부엌 입구에 서 있었고 사내와 엄마는 부엌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방아를 찧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순간 도망칠까도 생각했는데 어리나이엿지만 엄마와 아저씨의 다음 행동이 무척 궁금했다.
" 빼---- 얘가 보잖아--------"
엄마의 엉덩이가 잠시 요동치며 움직이는가 싶더니
" 좀만 좀만 좀만 ----- 나온다 나온다 욱욱욱------"
엄마는 내가 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사내의 몸에서 떨어졌다.
사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난 어른 좇을 첨으로 보았다.
시커멓고 굵은 좇대가 마치 앞산에 난 송이버섯 마냥 흉칙스럽다.
" 민수야 배고프지 엄마가 점심 얼른 체려 줄께"
엄마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머리와 옷매무새를 어루만지며 수돗가로 쫒기듯 사라진다.
" 짜식 똘망하게 생겼네---------공부잘해라 -----"
사내는 오백원짜리 지폐를 한장 주면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을 나선다.
사내의 어깨엔 제비문양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사내가 썻던 모자 속에서도 제비가 그려져 있었다.
사내 또한 쫒기듯 대문에서 사라져간다.
난 수돗가 여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근데 엄마가 치마를 허리까지 들추고는 사타구니 속을 비벼대며 씻고 있었다.
어렴풋이나마 엄마의 보지를 첨으로 본 것이다.
"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때당시 엄마의 히멀건 속살을 봤다는 설레임보단 제비문양의 모자를 눌러쓴 사내의 정체가 더욱 궁금했다.
"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우체부아저씨가 엄마 치료해주고 나가신거야"
" 근데 왜 발가벗고 치료해?-----"
" 그건--------"
" 민수야 너 오늘 본거 아빠한테 아니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돼 알았지?"
" 왜?------"
" 그럼 엄마 죽어"
" 왜 우체부 아저씨가 치료 안해줘서?-----"
" 그래 민수가 다른사람한테 얘기하면 우체부 아저씨가 다신 엄마 치료 안해주신데------"
그날 엄마는 왜 발가벗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았다.
물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는 됏지만----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드러가기 전인건 확실한데 언제쩍인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날 엄마와 우체부 아저씨와의 정사 장면은 어린 나에게는 무척 충격적이였나 보다.
내 어릴적 기억속에서 생각나는거라곤 엄마와 우체부아저씨와의 격정적인 씹질 이외에는 생각나는게 없다.
며칠후
" 엄마 우체부 아저씨 이제 안와?"
난 마루에 걸터 앉아 파를 다듬던 엄마를 올려다보며 얘길 꺼낸다.
물론 엄마와 나 둘뿐이엿다.
내가 다른사람에게 얘기하면 정말로 엄마가 죽는줄로만 알았다.
" 오실꺼야-------"
" 엄마 근데 마니 치료해야돼?"
" 그래 아주 마니 --------"
" 그러다 다른 사람이 보면 엄마 죽을지도 모르잖아?"
-----------------
그때 창모자를 눌러쓴 우체부가 대문을 열고 드러온다.
얼굴에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넘고 있었다.
" 안녕하세요-----"
기분은 나빴지만 어떻하랴 엄마를 치료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신데…
" 아저씨 엄마 빨랑 낳게 해주세요 ----네"
난 천진한 눈빛으로 아저씨를 존경스럽게 쳐다본다.
" 얘 뭔소리 하는겨?"
아저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게로 다가선다.
" 민수야 어여 나가 놀아 ---- 어여"
엄마는 손을 휘휘 젓고 있었다.
" 엄마 나 치료하는거 구경하면 안돼?"
" 안돼 큰일나 엄마 죽어------"
" 에씨 보고 싶은데------"
난 궁시렁거리며 대문을 나왔으나 궁금한건 어쩔수 없었던 모양이다.
몰래 다시 대문을 드러간다.
아저씨는 엄마의 궁둥이를 토닥거리며 안방으로 드러서고 있었다.
에씨 부엌에서 치료하지---- 그럼 몰래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소리라도 들을 요량으로 안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에 귀를 귀울인다.
" 아 씨발 빨리좀 벗어 존나 하고 싶어 미치겟어"
" 이사람 우물에 가서 숭늉 찾을 사람이네-----"
" 아 진짜 밍기적 그럴껴?"
" 그럼 그 모자라도 벗어요 ---- 땀도 안나나봐"
" 알았어 알았으니깐 팬티 마저 벗어"
" 창피한데-----"
" 미친년 오늘따라 별스럽게 지랄해대네------"
" 자 돌아봐 내가 벗겨 줄께"
" 아파요 좀 살살-----"
" 으메 으메----- 좋은겨"
" 철퍼덕 척척 철퍼덕 척척"
살과 살이 맞부딯히며 내는 마찰음이 귓가에 들려온다.
그러더니 그날 들었던 엄마의 탄성이 또다시 들러오기 시작하고 있다.
" 음-----음----악"
가끔 엄만 외마디 비명을 토해 놓는다.
치료가 무진장 아픈가 보다.
난 눈에서 눈물을 글썽거린다.
저러다 엄마가 죽은면 얼케하나-----
참으려 참으려 했지만 엄마의 계속되는 비명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엇다.
" 아저씨 살살 해요 엄마 죽어요"
난 마루에 털버덕 주저 앉아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다.
" 이게 뭔소리여?"
" 아 씨발 아들래미 아냐?"
그리곤 뭔가 부시럭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안방문이 덜커덩 열린다.
" 엄마"
엄마가 예전과 같이 머리며 옷매무새를 어루만지면서 방을 나서고 있었다.
난 무작정 엄마에게로 가 안겼다.
" 엄마 죽지마 엄마야------"
난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신나게 울엇다.
" 민수야 울지마 울지마----- 엄마 안죽어"
그때 느꼈던 엄마의 가슴은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따뜻했다.
" 너 자꾸 그러면 아저씨 다신 안올껴"
우체부 아저씨가 가방을 짚어 메고 방문을 나선며 나를 쏘아 붙인다.
" 엉어어어어어엉"
난 그때까지 울음이 멈춰지지 않는다.
" 아주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퉷"
우체부 아저씨는 성난 목소리를 해대며 대문을 나선다.
난 그렇게 엄마의 가슴에 안겨 조용히 잠이 든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잠꼬대를 해대며 잠을 잔 모양이다.
" 엄마 죽지마 엄마야 죽지마라------"
날 누군가 툭툭치는 느낌으로 잠에서 깬다.
" 낼모래 핵교 갈 놈이 아직까지 엄마 타령이냐?"
아빠였다.
" 빨랑가서 막거리 한되박이나 받아와"
" 아씨 아빤 알지도 못하면서------"
" 임마 아빠가 뭘모른다는 거야 "
맞다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 아냐 암것도------"
" 너 아빠 심부름 안할려고 잔꾀부리다간 아빠한테 정말로 혼난다."
" 빨랑가서 막걸리나 받아와 -----"
" 알았어"
난 양은 주전자를 찾으려 부엌문을 열고 드러선다.
엄마는 무엇에라도 놀란거마냥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 엄마 나 아빠한테 얘기 안했어"
난 조그만 소리로 엄마를 안심시킨다.
" 아고 내새끼 넘 착한 내새끼"
엄마는 나의 엉덩이를 톡톡톡 두드려 주신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나으셔야 될텐데…
난 막걸리를 받으러 가면서 달님에게 기도한다.
" 하느님 하느님 우리엄마 빨랑 낫게 해주세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