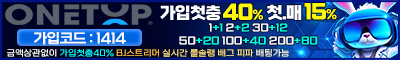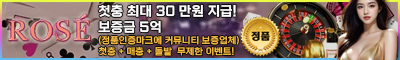우울한 날의 광시곡 - 7부
관리자
로맨스
0
5035
2018.12.23 14:17
승태를 만나 돈을 건네고, 미스한이나 불러낼 겸해서 다방에 들른 석채가 목격한 것은 낯선 남자와 은수였다.
어젯밤 우연히 은수의 자위장면을 목격한 일로 해서 예전과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 상황에, 낯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은 뜻밖이었다.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방 한쪽 구석에서 관심있게 보고있는 차에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에 놀라 황급히 달려온 것이다.
“넌 뭐야!!”
소리지르며 다시 일어나려는 박전무의 머리를 눌러 주저 앉힌 석채가 박전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어이쿠!!”
우당탕거리며 소파와 함께 박전무가 나가 떨어졌다.
석채가 다가가 박전무의 멱살을 움켜쥐고 일으켰다.
박전무의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제수씨하고 무슨 관계인줄은 모르겠지만 한번만 더 괴롭히면 그 뺀질뺀질한 얼굴을 고속도로로 만들어 버릴 줄 알아”
얼굴이 시뻘개진 박전무가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자 석채와 은수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괜찮으세요 제수씨?”
“예…예…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허겁지겁 일어난 은수가 다방을 빠져 나오려다 멈칫하며 석채에게 얼굴을 돌렸다.
“저….윤사장님”
“예?”
“저…..아니예요. 오늘 고맙습니다”
석채는 왠지 착잡한 마음으로 서둘러 다방을 나가는 은수를 바라보았다.
은수의 몸에 꽉 끼는 청바지가 유난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수씨가 웬 일이세요?”
석채가 은수의 전화를 받은 것은 다방에서의 일이 있고 난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저…말씀드릴 것이…”
은수는 잘 알아 듣기도 힘들만큼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꼬리를 흐리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한번 뵙죠. 기정이가 보면 오해 살 수도 있을 테니 좀 먼데서 만나죠”
석채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자신이 가끔 가는 시 외곽의 고급 음식점 이름을 알려준 뒤 약속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수가 왜 은밀하게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지에 대해 추측해봤지만 잘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자신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들키기는 했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지 않은가.
굳이 만나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 할만한 사안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더 쑥스러울 것이었다.
혹시 그날 밤 기정을 미스정에게 보낸 것을 알았을까?
기정이 아무 말도 안 했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미스정 자취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지는 예상이 되었다.
전화를 받던 기정의 목소리도 그렇고, 다음날 출근한 미스정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기정과 만리장성을 쌓았는지 물어봤지만 혀를 낼름 내밀며 메롱 하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심증이 확실해진 것은 어제, 모처럼 미스정과 같이 땀이나 흠뻑 흘려볼까 싶어 부동산 사무실로 커피배달을 시켰을 때였다.
거의 3~4일에 한번씩 속궁합을 맞춘 사이여서 미스정의 생리가 겨우 2주일 전에 끝났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미스정은 생리를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엉덩이를 씰룩거리며 나가는 미스정의 뒷모습을 보고 석채는 터질 듯 솟아오른 자신의 물건을 부여잡은 채 중얼거렸었다.
‘저것들이 드디어 붙어버렸군’
미스정을 기정에게 뺏기기는 했지만 석채는 왠지 재미있었다.
스스로 의리(?)있다고 생각하니 만큼 은수에게 기정과 미스정 사이의 일을 자신이 먼저 말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샌님 같은 기정이 미스정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괜히 고소해졌다.
어쩌면 그날 밤, 여관에 숨겨놓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기정을 미스정에게 보낸 것도 자신의 장난기가 시켜서 일 지도 몰랐다.
혹시 이 사실을 은수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은수가 기정과 미스정과의 관계를 눈치채고 추궁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갑자기 석채는 난감해졌다.
“드세요…다 익었는데”
불판의 한우 등심이 익다 못해 다 타고 있는데도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조차 집어 들지 않았다.
고기를 시키기 전부터 계속 저 모양새였다.
“아…참…다 탄다니까요”
허겁지겁 자신의 입에 타고 있는 고기를 쑤셔 넣으며 석채가 재촉했다.
“윤사장님께 부탁이 있어요”
그제서야 은수가 고개를 들었다.
“예, 뭐든지 말씀하세요”
“윤사장님이 부자라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만나자마자 은수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할 얘기라는 것이 기정과 미스정의 관계 추궁보다는 목욕탕에서의 민망한 모습을 잊어달라는 쪽이라고 생각했던 터에 돈타령이라니…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좀 있죠”
“남편도 조금씩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꺼내기가 어려웠지 한번 뱉어내고 나니 한결 수월하게 말이 나왔다.
“별거 아니예요 (조금이 아니라 제법 되는데…하하)”
“그러면…….그러면…….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참 뜸을 들이던 은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예?”
석채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은수가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이 시추에이션이 이해되지 않았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는게 아니라, 꼭 갚을게요. 그냥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까요?”
“그렇다면…..음….그러니까….담보는 있어요?”
엥? 석채는 말을 뱉어놓고 아차 싶었다. 은수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액이 아니면 그냥 줄 수도 있었다.
더구나 은수가 지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렇게 힘겹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장난이라니…
“아…아하하…담보는 농담이구요”
“담보는 없어요. 대신….”
은수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듯 석채의 말을 잘랐다.
“제 몸을 드릴게요”
기어들어가는 듯한 말이었지만, 석채는 분명히 들었다.
석채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우연히 제가 제수씨의 몸을 목격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전혀 관계 없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그 일과 관계없이 저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기정이가 알면 안되는 돈인가요?”
“알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정씨가 안다고 해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생명줄인 PC방 보증금은 뺄 수 없으니까요”
석채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은수가 얼마나 심각한 고민 끝에 지금 이 말을 했을지 짐작이 갔다.
“좋아요. 빌려드리죠. 기한은 따로 없어요. 제수씨 몸도 필요 없구요”
“그건 제가 안돼요. 윤사장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받기는 싫어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어요”
이미 불판의 등심은 까맣게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
은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머리 속에 맴돌고 있을 때 박전무의 전화를 받고 은수는 박전무에게 몸을 담보로 돈을 부탁해볼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다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생각을 깨끗이 접었다.
대신 떠오른 얼굴이 석채였다.
마침 석채는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부탁하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았다.
그러나 결심을 굳히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다.
이젠 되돌릴 수 없다.
은수는 석채와 모텔에 들어가면서 아랫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돈은 얼마라도 해드릴게요”
석채는 다소곳이 모텔방 침대에 걸터 앉은 은수를 보며 딱하다는 듯 말을 붙였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잇던 은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벗기 시작했다.
“나는 어차피 난봉군으로 소문 났으니 상관없지만, 제수씨가 기정이에게 죄 짓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석채가 옷을 벗고 있는 은수의 손목을 잡아챘다.
은수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는 윤사장님 만나기 전에 이미 죄를 지었어요”
전기에라도 감전된 듯 석채가 팔을 놓자 은수는 블라우스의 단추를 차근차근 풀고는 스커트의 버튼까지 풀어냈다.
순식간에 옷곳에 감춰져 있던 매끈한 몸매가 드러났다.
어젯밤 우연히 은수의 자위장면을 목격한 일로 해서 예전과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 상황에, 낯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은 뜻밖이었다.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방 한쪽 구석에서 관심있게 보고있는 차에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에 놀라 황급히 달려온 것이다.
“넌 뭐야!!”
소리지르며 다시 일어나려는 박전무의 머리를 눌러 주저 앉힌 석채가 박전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어이쿠!!”
우당탕거리며 소파와 함께 박전무가 나가 떨어졌다.
석채가 다가가 박전무의 멱살을 움켜쥐고 일으켰다.
박전무의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제수씨하고 무슨 관계인줄은 모르겠지만 한번만 더 괴롭히면 그 뺀질뺀질한 얼굴을 고속도로로 만들어 버릴 줄 알아”
얼굴이 시뻘개진 박전무가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자 석채와 은수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괜찮으세요 제수씨?”
“예…예…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허겁지겁 일어난 은수가 다방을 빠져 나오려다 멈칫하며 석채에게 얼굴을 돌렸다.
“저….윤사장님”
“예?”
“저…..아니예요. 오늘 고맙습니다”
석채는 왠지 착잡한 마음으로 서둘러 다방을 나가는 은수를 바라보았다.
은수의 몸에 꽉 끼는 청바지가 유난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수씨가 웬 일이세요?”
석채가 은수의 전화를 받은 것은 다방에서의 일이 있고 난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저…말씀드릴 것이…”
은수는 잘 알아 듣기도 힘들만큼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꼬리를 흐리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한번 뵙죠. 기정이가 보면 오해 살 수도 있을 테니 좀 먼데서 만나죠”
석채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자신이 가끔 가는 시 외곽의 고급 음식점 이름을 알려준 뒤 약속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수가 왜 은밀하게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지에 대해 추측해봤지만 잘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자신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들키기는 했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지 않은가.
굳이 만나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 할만한 사안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더 쑥스러울 것이었다.
혹시 그날 밤 기정을 미스정에게 보낸 것을 알았을까?
기정이 아무 말도 안 했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미스정 자취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지는 예상이 되었다.
전화를 받던 기정의 목소리도 그렇고, 다음날 출근한 미스정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기정과 만리장성을 쌓았는지 물어봤지만 혀를 낼름 내밀며 메롱 하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심증이 확실해진 것은 어제, 모처럼 미스정과 같이 땀이나 흠뻑 흘려볼까 싶어 부동산 사무실로 커피배달을 시켰을 때였다.
거의 3~4일에 한번씩 속궁합을 맞춘 사이여서 미스정의 생리가 겨우 2주일 전에 끝났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미스정은 생리를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엉덩이를 씰룩거리며 나가는 미스정의 뒷모습을 보고 석채는 터질 듯 솟아오른 자신의 물건을 부여잡은 채 중얼거렸었다.
‘저것들이 드디어 붙어버렸군’
미스정을 기정에게 뺏기기는 했지만 석채는 왠지 재미있었다.
스스로 의리(?)있다고 생각하니 만큼 은수에게 기정과 미스정 사이의 일을 자신이 먼저 말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샌님 같은 기정이 미스정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괜히 고소해졌다.
어쩌면 그날 밤, 여관에 숨겨놓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기정을 미스정에게 보낸 것도 자신의 장난기가 시켜서 일 지도 몰랐다.
혹시 이 사실을 은수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은수가 기정과 미스정과의 관계를 눈치채고 추궁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갑자기 석채는 난감해졌다.
“드세요…다 익었는데”
불판의 한우 등심이 익다 못해 다 타고 있는데도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조차 집어 들지 않았다.
고기를 시키기 전부터 계속 저 모양새였다.
“아…참…다 탄다니까요”
허겁지겁 자신의 입에 타고 있는 고기를 쑤셔 넣으며 석채가 재촉했다.
“윤사장님께 부탁이 있어요”
그제서야 은수가 고개를 들었다.
“예, 뭐든지 말씀하세요”
“윤사장님이 부자라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만나자마자 은수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할 얘기라는 것이 기정과 미스정의 관계 추궁보다는 목욕탕에서의 민망한 모습을 잊어달라는 쪽이라고 생각했던 터에 돈타령이라니…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좀 있죠”
“남편도 조금씩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꺼내기가 어려웠지 한번 뱉어내고 나니 한결 수월하게 말이 나왔다.
“별거 아니예요 (조금이 아니라 제법 되는데…하하)”
“그러면…….그러면…….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참 뜸을 들이던 은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예?”
석채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은수가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이 시추에이션이 이해되지 않았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는게 아니라, 꼭 갚을게요. 그냥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까요?”
“그렇다면…..음….그러니까….담보는 있어요?”
엥? 석채는 말을 뱉어놓고 아차 싶었다. 은수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액이 아니면 그냥 줄 수도 있었다.
더구나 은수가 지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렇게 힘겹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장난이라니…
“아…아하하…담보는 농담이구요”
“담보는 없어요. 대신….”
은수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듯 석채의 말을 잘랐다.
“제 몸을 드릴게요”
기어들어가는 듯한 말이었지만, 석채는 분명히 들었다.
석채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우연히 제가 제수씨의 몸을 목격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전혀 관계 없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그 일과 관계없이 저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기정이가 알면 안되는 돈인가요?”
“알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정씨가 안다고 해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생명줄인 PC방 보증금은 뺄 수 없으니까요”
석채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은수가 얼마나 심각한 고민 끝에 지금 이 말을 했을지 짐작이 갔다.
“좋아요. 빌려드리죠. 기한은 따로 없어요. 제수씨 몸도 필요 없구요”
“그건 제가 안돼요. 윤사장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받기는 싫어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어요”
이미 불판의 등심은 까맣게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
은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머리 속에 맴돌고 있을 때 박전무의 전화를 받고 은수는 박전무에게 몸을 담보로 돈을 부탁해볼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다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생각을 깨끗이 접었다.
대신 떠오른 얼굴이 석채였다.
마침 석채는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부탁하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았다.
그러나 결심을 굳히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다.
이젠 되돌릴 수 없다.
은수는 석채와 모텔에 들어가면서 아랫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돈은 얼마라도 해드릴게요”
석채는 다소곳이 모텔방 침대에 걸터 앉은 은수를 보며 딱하다는 듯 말을 붙였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잇던 은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벗기 시작했다.
“나는 어차피 난봉군으로 소문 났으니 상관없지만, 제수씨가 기정이에게 죄 짓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석채가 옷을 벗고 있는 은수의 손목을 잡아챘다.
은수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는 윤사장님 만나기 전에 이미 죄를 지었어요”
전기에라도 감전된 듯 석채가 팔을 놓자 은수는 블라우스의 단추를 차근차근 풀고는 스커트의 버튼까지 풀어냈다.
순식간에 옷곳에 감춰져 있던 매끈한 몸매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