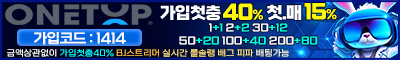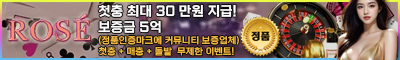본능에 충실하기 - 2부
관리자
경험담
0
6229
2019.02.06 23:40
늙은 식모와의 그밤이후 난 후회막급해 했다
아무리 궁하기로 내 동정을 할망구에게 바치다니
비록 직접 보지속으로 삽입은 안했지만 입으로 물리고 손에 온통 보짓물 범벅을 해놨으니
한거나 진배없지 않은가
뒷간에서 일보고 나온 담 달라진 마음이라더니 꼭 그짝으로 찝지르한 불쾌감이 날 괴롭혔다
헌데 그것이 나의 일방적 감상이었다는걸 알아체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앗다
난 그 다음날로 친구와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저녁마다 친구집으로 가서 잤고
낮에도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위해 집에서도 괜히 겉돌기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사나흘이 지나니 우선은 내가 고단해서 안되겠고 엄마의 꾸지람도 있고해서
할수없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날 밤
방으로 들어온 난 진동하는 냄새에 어리둥절했다
그것은 일종의 향수였는데 지금으로치면 아주 저급한 싸구려 파마집에서 나는듯한
코끝을 때리고 매달리는 그런 막향기였다
"할머니 이게 무슨 냄새에요?;
난 평소엔 쓰지도 않던 할머니란 존칭에 힘을주고 물었다 (그 전엔 아줌마라 불렀다)
;응 거 전에 아들놈이 보내준건데 아까워서 안쓰고 있다가 방에 습기가 차 왠지 퀴퀴한 내가
나는것 같아서 쪼매 뿌려봤지;
환장하겄네.. 갑자기 왠 향수는 , 난 집히는 바가 없는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서
;난 이 냄새가 싫네요 머리가 아퍼요;
;.....응 그래 딴이들은 좋타구 하던디 알았서 인제 안뿌릴라니;
이것저것 부닥끼는 상황도 거북스럽고 해서 바닥에 자리를 피자마자 홑이불을 머리위까지
뒤집어 썼는데
;아휴 더워 난 끈적해서 목간이라도 하구 자야쓰겄네;
늙은 식모가 방을 나간후 여러 상념이 스쳤지만 생각이 많아봐야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아
억지로 잠을 청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막 잠이 들었던거 같은데 누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학상 모기장을 쳐야겠어 요즘 부쩍 모기가 많아 모기향도 소용없구 약두 냄새만 나지 안들어 먹어;
;에이, 그냥 자면 안돼여?;
;글씨 사정없이 문대니께 못당하겄어서 그제 부터 모기장을 치고 안나잠;
할수없이 일어나 모기장 치는것을 거들었는데 이것이 방전체를 가릴만한 크기가 아니라
늙은 식모와의 간격을 좁힐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우리는 모기장 안에 같이 갇힌 꼴이 되었다
또 뭔 수작을 걸어올까하고 이불을 끌어올리며 보니 그녀는 어느새 고쟁이 바람이 되엇는데
헉, 꽃무늬, 세상에 고쟁이도 꽃무늬가 있나 그녀는 옅은 크림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랬거나 말거나 잠을 청할려니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두시쯤 늙은 식모도 나도 서로 뒤척이며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찰싹, ;아구 따가라 이놈의 모기가 어케 들어왔남;
넙적다리를 치는 시늉을 하며 늙은 식모의 한쪽다리가 날 거더 차는데 놀라 등을 돌려보니
그녀는 잠꼬대를 한것 마냥 눈을 감고 입술을 씰룩이는데 이불은 팽개쳐있고 고쟁이는 무릎 밑으로
내려져 있었다
아! 또 그 둔덕, 꼬리까지 짤리고 악착같이 창문을 뚫고 들어온 달빛이 모인 바로 그자리에
정확하게 그녀는 보지를 갖다대고 있었다
月下의 공동묘지가 아니고 月下의 보지를 본적 있는가
젊은것 못지않게 무성한 수풀 한참 색기에 동해서 부풀어오른 보짓살
더군다나 그것은 가만있지를 않고 자근자근 자맥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영화감독의 큐싸인에 맞춰 액션에 들어간 배우마냥 내가 고개를 돌리자 예전의 그
요분질을 시작한 것이다
너울너울 거풀거풀 음영이 어우러진 엉덩이 위로 춤을 추는 보지, 그 향연
내좃은 또 주체할수 없이 발광을 해댔다
나는 자의와는 상관없이 좃을 붙잡고 흔들어 댔다
씹은 하지 말아야지 씹은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렇게 딸딸이만 치고 말테다
그러면서도 난 보지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는데 그때 바로 그만 찍~~하고 좃물을 토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좃물이 평소의 사정거리를 넘어 그녀의 배와 둔덕근처에 뿌려져 버렸다
잠시 반응이 없던 그녀는 살그머니 한쪽 손을 들어 배와 둔덕에 묻은 좃물을 모으더니
자기 보짓살 쪽으로 가져가 손가락으로 질속을 빌며 흔들어 대었다
질껑찔껑, 쭉쯔르즈 찌구덩찌구덩
보지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이건 환장할 노릇이다
푸그덕 삣삐 퍽퍽 짹짹
얇게 벌어진 입술이 떨림을 하며 푸르르르 뿔ㅡ르르 끄ㅡ
이엉이~~ 이어ㅡㄹ 호ㅗㅗㅗ 메 별 괴상망칙한 노래가 나오는데
좀전에 쏟은 좃물이 채마르지도 않은 내좃은 벌써 다시 성을 내고 있었다
이번엔 몸을 일으켜 아예 가부좌 자세로 좃을잡고 흔들어 대니까 내입에서도 신음이 터져나왔다
;학상, ~ 학~상 응~`학상,, 응 ...한 버..ㄴ
그녀는 내가 또 좃을 붙잡고 혼자 해결할 기색을 보이자 한손으로 연신 보지를 쑤셔대며
울것같은 표정으로 호소를 하는데 그 모습이 하필 또 달빛에 묻어 그렇게 예뻐보일수가 없었다
(여인의 모습은 조명빨이 대신한다더니 세상의 여인들이여 모쪼록 빛이란 빛은 다 간수를 잘하길)
; 알았어요 아줌마 (호칭이 어느새 아줌마로 돌아왔다) 대신 이번 딱 한번 만이에요
알았죠 약속해요?;
그녀는 어찌나 급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데 꼭 울다가 과자를 얻어먹는 어린아이 같았다
어쨋거나 내좃은 보지맛을 첨 보는거 아닌가 이미 범벅이 된 그녀의 구멍을 갖다대자 좃은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열을 내는데 집어넣는 순간 그녀가 흠뻑 놀란다
찌그덕 퍽 찌그덕 퍽 퍽퍽퍽퍽
누가 가르쳐준적 없어도 내 엉덩이는 열심히 맷돌질을 해댔고 어느새 입이 맞춰진 둘은 한쪽으론
침을 갈고 한쪽으론 비명을 토해낸다
히히히힝 히,히,히, 끙
으갸갸가 으으 으~~ 읏쌰 으쌰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때 나는 응원가 소리처럼 들리는 두 사람의 하모니가 쪽창문 밖으로 퍼져 나갔다
아무리 궁하기로 내 동정을 할망구에게 바치다니
비록 직접 보지속으로 삽입은 안했지만 입으로 물리고 손에 온통 보짓물 범벅을 해놨으니
한거나 진배없지 않은가
뒷간에서 일보고 나온 담 달라진 마음이라더니 꼭 그짝으로 찝지르한 불쾌감이 날 괴롭혔다
헌데 그것이 나의 일방적 감상이었다는걸 알아체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앗다
난 그 다음날로 친구와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저녁마다 친구집으로 가서 잤고
낮에도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위해 집에서도 괜히 겉돌기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사나흘이 지나니 우선은 내가 고단해서 안되겠고 엄마의 꾸지람도 있고해서
할수없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날 밤
방으로 들어온 난 진동하는 냄새에 어리둥절했다
그것은 일종의 향수였는데 지금으로치면 아주 저급한 싸구려 파마집에서 나는듯한
코끝을 때리고 매달리는 그런 막향기였다
"할머니 이게 무슨 냄새에요?;
난 평소엔 쓰지도 않던 할머니란 존칭에 힘을주고 물었다 (그 전엔 아줌마라 불렀다)
;응 거 전에 아들놈이 보내준건데 아까워서 안쓰고 있다가 방에 습기가 차 왠지 퀴퀴한 내가
나는것 같아서 쪼매 뿌려봤지;
환장하겄네.. 갑자기 왠 향수는 , 난 집히는 바가 없는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서
;난 이 냄새가 싫네요 머리가 아퍼요;
;.....응 그래 딴이들은 좋타구 하던디 알았서 인제 안뿌릴라니;
이것저것 부닥끼는 상황도 거북스럽고 해서 바닥에 자리를 피자마자 홑이불을 머리위까지
뒤집어 썼는데
;아휴 더워 난 끈적해서 목간이라도 하구 자야쓰겄네;
늙은 식모가 방을 나간후 여러 상념이 스쳤지만 생각이 많아봐야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아
억지로 잠을 청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막 잠이 들었던거 같은데 누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학상 모기장을 쳐야겠어 요즘 부쩍 모기가 많아 모기향도 소용없구 약두 냄새만 나지 안들어 먹어;
;에이, 그냥 자면 안돼여?;
;글씨 사정없이 문대니께 못당하겄어서 그제 부터 모기장을 치고 안나잠;
할수없이 일어나 모기장 치는것을 거들었는데 이것이 방전체를 가릴만한 크기가 아니라
늙은 식모와의 간격을 좁힐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우리는 모기장 안에 같이 갇힌 꼴이 되었다
또 뭔 수작을 걸어올까하고 이불을 끌어올리며 보니 그녀는 어느새 고쟁이 바람이 되엇는데
헉, 꽃무늬, 세상에 고쟁이도 꽃무늬가 있나 그녀는 옅은 크림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랬거나 말거나 잠을 청할려니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두시쯤 늙은 식모도 나도 서로 뒤척이며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찰싹, ;아구 따가라 이놈의 모기가 어케 들어왔남;
넙적다리를 치는 시늉을 하며 늙은 식모의 한쪽다리가 날 거더 차는데 놀라 등을 돌려보니
그녀는 잠꼬대를 한것 마냥 눈을 감고 입술을 씰룩이는데 이불은 팽개쳐있고 고쟁이는 무릎 밑으로
내려져 있었다
아! 또 그 둔덕, 꼬리까지 짤리고 악착같이 창문을 뚫고 들어온 달빛이 모인 바로 그자리에
정확하게 그녀는 보지를 갖다대고 있었다
月下의 공동묘지가 아니고 月下의 보지를 본적 있는가
젊은것 못지않게 무성한 수풀 한참 색기에 동해서 부풀어오른 보짓살
더군다나 그것은 가만있지를 않고 자근자근 자맥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영화감독의 큐싸인에 맞춰 액션에 들어간 배우마냥 내가 고개를 돌리자 예전의 그
요분질을 시작한 것이다
너울너울 거풀거풀 음영이 어우러진 엉덩이 위로 춤을 추는 보지, 그 향연
내좃은 또 주체할수 없이 발광을 해댔다
나는 자의와는 상관없이 좃을 붙잡고 흔들어 댔다
씹은 하지 말아야지 씹은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렇게 딸딸이만 치고 말테다
그러면서도 난 보지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는데 그때 바로 그만 찍~~하고 좃물을 토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좃물이 평소의 사정거리를 넘어 그녀의 배와 둔덕근처에 뿌려져 버렸다
잠시 반응이 없던 그녀는 살그머니 한쪽 손을 들어 배와 둔덕에 묻은 좃물을 모으더니
자기 보짓살 쪽으로 가져가 손가락으로 질속을 빌며 흔들어 대었다
질껑찔껑, 쭉쯔르즈 찌구덩찌구덩
보지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이건 환장할 노릇이다
푸그덕 삣삐 퍽퍽 짹짹
얇게 벌어진 입술이 떨림을 하며 푸르르르 뿔ㅡ르르 끄ㅡ
이엉이~~ 이어ㅡㄹ 호ㅗㅗㅗ 메 별 괴상망칙한 노래가 나오는데
좀전에 쏟은 좃물이 채마르지도 않은 내좃은 벌써 다시 성을 내고 있었다
이번엔 몸을 일으켜 아예 가부좌 자세로 좃을잡고 흔들어 대니까 내입에서도 신음이 터져나왔다
;학상, ~ 학~상 응~`학상,, 응 ...한 버..ㄴ
그녀는 내가 또 좃을 붙잡고 혼자 해결할 기색을 보이자 한손으로 연신 보지를 쑤셔대며
울것같은 표정으로 호소를 하는데 그 모습이 하필 또 달빛에 묻어 그렇게 예뻐보일수가 없었다
(여인의 모습은 조명빨이 대신한다더니 세상의 여인들이여 모쪼록 빛이란 빛은 다 간수를 잘하길)
; 알았어요 아줌마 (호칭이 어느새 아줌마로 돌아왔다) 대신 이번 딱 한번 만이에요
알았죠 약속해요?;
그녀는 어찌나 급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데 꼭 울다가 과자를 얻어먹는 어린아이 같았다
어쨋거나 내좃은 보지맛을 첨 보는거 아닌가 이미 범벅이 된 그녀의 구멍을 갖다대자 좃은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열을 내는데 집어넣는 순간 그녀가 흠뻑 놀란다
찌그덕 퍽 찌그덕 퍽 퍽퍽퍽퍽
누가 가르쳐준적 없어도 내 엉덩이는 열심히 맷돌질을 해댔고 어느새 입이 맞춰진 둘은 한쪽으론
침을 갈고 한쪽으론 비명을 토해낸다
히히히힝 히,히,히, 끙
으갸갸가 으으 으~~ 읏쌰 으쌰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때 나는 응원가 소리처럼 들리는 두 사람의 하모니가 쪽창문 밖으로 퍼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