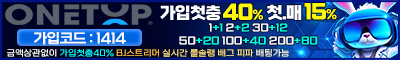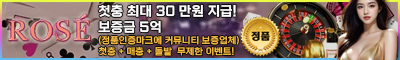미시도 여자다 - 1부 2장
관리자
경험담
0
5281
2019.03.09 02:04
미시도 여자다 - 지하철.
가까운 압구정역을 지나 신사역에 내리기로 했지만 역삼역까지 갔다.
택시로 무작정 어딜 간다는 건 사실상 어렵기 그지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던 차 에 근방이 2호선 역삼역이었다.
5천원을 주면서 택시기사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려 스커트 속을 슬쩍 본다. 창밖의 폭염을 아무 의미 없는 눈길로 비스듬히 기대어 여기까지 오는내내 그가 룸미러를 아래로 조절해서 날 보는 걸 알았었기에 당연히 내릴 때 그럴 거라는 생각은 했었다. 낯선 남자의 이글거리는 시선을 받으면서도 난 아무런 동요조차 없었다.
남루한 느낌. 그건 내가 정말 벗어나고픈 생활의 느낌과 다르지 않았다.
난 생활에서 벗어나고픈 것이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뒤로 하고 난 총총히 지하철 계단으로 몸을 미끄러트린다.
사람으로 가득한 곳.
공기부터가 다르다. 향기로운 여성의 비누와 바디로션 냄새 그리고 저마다 사연을 안고 있는 향수가 뒤섞여서 혼탁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바로 남자들의 땀냄새.
여름이라 그런지 더 심한 것 같다.
몇 주전보다 더 심한 걸 보니 말이다. 하긴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도 그 이유를 더하고 있어 살짝 미간을 찌프리게 한다. 어디로 갈까하는 생가은 만원 지하철을 푸쉬맨들에게 떠밀려 사방을 사람들로 가두어지고 난 뒤에 간신히 떠올랐지만 정작 생각나는 게 없었다.
부천에 있는 친구 순영이. 일찌감치 이혼해서 혼자가 된 후 술을 파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었다. 늘 나의 자잔한 고민같은 내 삶을 모두 제 일인양 들어주고 화가 나서 술을 연거풔 마시고 남편과의 문제를 들을 때치면 기어이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술을 마시던 여고시절의 순임이가 떠올랐다. 이른 시간이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핸폰을 꺼논 것을 알면서도 간혹 가게에서 자기도 하는 애니까 무작정 가보기로 했다.
생각보다 전철 안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앉을 자리가 쉽게 발견되지도 않았다. 한정거장이 지나 운이 좋게도 내 앞의 청년이 일어났다. 왜그리 고마운지 ^^ 덜컹거리는 지하철의 잔잔한 움직임과 덜컹거림은 분명 아침잠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인지 눈이 감긴다.
하얀 천으로 몸을 감싸고 침대에 누운 나의 머리컬은 아직 촉촉해서인지 윤지마저 흐르고 온몸을 휩감는 깨끗함은 정결함마저 더해 순수하다. 그러나 서서히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난 침대에서 다리를 벌리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라고하는 순간 그 두 다리 사이에 들어오는 또다를 다리.
치한이다.
31살정도된 셀러리맨.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품은 나에게 순영은 배부른 사모님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면 일갈했다. 그러나 얼마나 피곤했기에 자기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튈 수 있는 공간으로 밀려왔겠는가. 그러나 나는 성급히 벌어진 다리를 오무린다. 옆 사람이 봤을까하는 걱정까지 함께 그 두리 사이에 힘을 더한다. 그리곤 고개를 들어 보 어 본 얼굴. 그에게서 그 무엇도 느낄 수 없다. 그에게서는 그저 삶의 찌든 벗겨도 쉽게 벗겨지지않고 오히려 코팅이 벗겨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다리를 더 벌려서 그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싶다. 우쭐거리며 동료에게 오늘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하면서 자신있어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괜히 장난기도 생기고 왠지 아까 택시 운전사와는 달리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다리를 살짝 더 벌려 그의 허벅지와 종아리 무플을 내 몸으로 받는다. 둔탁하게 떨어지는 그의 육체. 그러나 연민 이상이 아니어서이지 아무런 감흥이 없다.
난 일어나 그를 앉혔다. 다음이 신도림이다. 부천에 가기 위해 환승해야 하는 신도림. 그러나 난 그 게이트의 열림을 뻔히 알면서도 일어선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벌리고 앉은 다리 사이에 내 허버지를 가져 댄다. 꿈틀거리는 그의 그 곳을 느끼면서 난 평안한 미소로 내릴 수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날 여인이 아니 그저 환자로 보기 시작했다. 할에도 몇 십명씩 완전히 벗은 두 다리 사이를 벌리고 그 안의 질까지 그에게 맡기는 여인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그에게 이십 년 이상 살아온 내 몸은 어떨까 생각해도 그럴 듯 싶었다.
신도림에서 갈아타야 했다. 층계를 내려가는 또각이는 하이힐의 소리는 내게 어떤 모를 긴장감을 주어 온몸에 힘을 주고 마치 미스코리아나 슈퍼 모델같은 자세를 요구한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며 걷는 모습. 그러나 계단은 언제나 이런 옷차림을 입고 오를 땐 더더욱 묘한 감정을 일으킨다. 감춰야 한다는 생각과 살짝 보여지고픈 욕망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오르게 된다. 어설픈 손동작으로 치마의 뒷자락을 잡지도 못하고 노출이 심할 듯 싶을 때만 핸드백으로 살짝 그 위치를 가리게 내 방법이다.
푸시맨이 간신히 집어넣어야 할 정도였다. 신도림역은 항상 만원이다
거의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며 푸쉬맨의 손길 속에서 지하철 안에 들어갔지만 내 뒤로도 더 들어왔고 도 그만큼 서로들이 밀팍되는 1호선.
두손에 백을 쥐고 가슴으로 모았다. 상대방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지만 아무래도 소매치기가 더 거슬리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치어 끙끙 거리는 신음이 들린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이 일을 매일같이 겪는 사람들이 못내 안스러웠다.
전화가 왔다. 간신히 백에서 꺼내 보니 남편이었다. 받고 싶지 않았다. 진동으로 해놓는 버릇 덕에 도로 백에 넣고는 다시 가슴께로 모으는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모든 쪽지에 답 못 드리고 몇몇 분에게만 답한거 죄송해요.
가까운 압구정역을 지나 신사역에 내리기로 했지만 역삼역까지 갔다.
택시로 무작정 어딜 간다는 건 사실상 어렵기 그지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던 차 에 근방이 2호선 역삼역이었다.
5천원을 주면서 택시기사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려 스커트 속을 슬쩍 본다. 창밖의 폭염을 아무 의미 없는 눈길로 비스듬히 기대어 여기까지 오는내내 그가 룸미러를 아래로 조절해서 날 보는 걸 알았었기에 당연히 내릴 때 그럴 거라는 생각은 했었다. 낯선 남자의 이글거리는 시선을 받으면서도 난 아무런 동요조차 없었다.
남루한 느낌. 그건 내가 정말 벗어나고픈 생활의 느낌과 다르지 않았다.
난 생활에서 벗어나고픈 것이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뒤로 하고 난 총총히 지하철 계단으로 몸을 미끄러트린다.
사람으로 가득한 곳.
공기부터가 다르다. 향기로운 여성의 비누와 바디로션 냄새 그리고 저마다 사연을 안고 있는 향수가 뒤섞여서 혼탁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바로 남자들의 땀냄새.
여름이라 그런지 더 심한 것 같다.
몇 주전보다 더 심한 걸 보니 말이다. 하긴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도 그 이유를 더하고 있어 살짝 미간을 찌프리게 한다. 어디로 갈까하는 생가은 만원 지하철을 푸쉬맨들에게 떠밀려 사방을 사람들로 가두어지고 난 뒤에 간신히 떠올랐지만 정작 생각나는 게 없었다.
부천에 있는 친구 순영이. 일찌감치 이혼해서 혼자가 된 후 술을 파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었다. 늘 나의 자잔한 고민같은 내 삶을 모두 제 일인양 들어주고 화가 나서 술을 연거풔 마시고 남편과의 문제를 들을 때치면 기어이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술을 마시던 여고시절의 순임이가 떠올랐다. 이른 시간이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핸폰을 꺼논 것을 알면서도 간혹 가게에서 자기도 하는 애니까 무작정 가보기로 했다.
생각보다 전철 안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앉을 자리가 쉽게 발견되지도 않았다. 한정거장이 지나 운이 좋게도 내 앞의 청년이 일어났다. 왜그리 고마운지 ^^ 덜컹거리는 지하철의 잔잔한 움직임과 덜컹거림은 분명 아침잠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인지 눈이 감긴다.
하얀 천으로 몸을 감싸고 침대에 누운 나의 머리컬은 아직 촉촉해서인지 윤지마저 흐르고 온몸을 휩감는 깨끗함은 정결함마저 더해 순수하다. 그러나 서서히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난 침대에서 다리를 벌리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라고하는 순간 그 두 다리 사이에 들어오는 또다를 다리.
치한이다.
31살정도된 셀러리맨.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품은 나에게 순영은 배부른 사모님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면 일갈했다. 그러나 얼마나 피곤했기에 자기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튈 수 있는 공간으로 밀려왔겠는가. 그러나 나는 성급히 벌어진 다리를 오무린다. 옆 사람이 봤을까하는 걱정까지 함께 그 두리 사이에 힘을 더한다. 그리곤 고개를 들어 보 어 본 얼굴. 그에게서 그 무엇도 느낄 수 없다. 그에게서는 그저 삶의 찌든 벗겨도 쉽게 벗겨지지않고 오히려 코팅이 벗겨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다리를 더 벌려서 그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싶다. 우쭐거리며 동료에게 오늘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하면서 자신있어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괜히 장난기도 생기고 왠지 아까 택시 운전사와는 달리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다리를 살짝 더 벌려 그의 허벅지와 종아리 무플을 내 몸으로 받는다. 둔탁하게 떨어지는 그의 육체. 그러나 연민 이상이 아니어서이지 아무런 감흥이 없다.
난 일어나 그를 앉혔다. 다음이 신도림이다. 부천에 가기 위해 환승해야 하는 신도림. 그러나 난 그 게이트의 열림을 뻔히 알면서도 일어선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벌리고 앉은 다리 사이에 내 허버지를 가져 댄다. 꿈틀거리는 그의 그 곳을 느끼면서 난 평안한 미소로 내릴 수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날 여인이 아니 그저 환자로 보기 시작했다. 할에도 몇 십명씩 완전히 벗은 두 다리 사이를 벌리고 그 안의 질까지 그에게 맡기는 여인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그에게 이십 년 이상 살아온 내 몸은 어떨까 생각해도 그럴 듯 싶었다.
신도림에서 갈아타야 했다. 층계를 내려가는 또각이는 하이힐의 소리는 내게 어떤 모를 긴장감을 주어 온몸에 힘을 주고 마치 미스코리아나 슈퍼 모델같은 자세를 요구한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며 걷는 모습. 그러나 계단은 언제나 이런 옷차림을 입고 오를 땐 더더욱 묘한 감정을 일으킨다. 감춰야 한다는 생각과 살짝 보여지고픈 욕망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오르게 된다. 어설픈 손동작으로 치마의 뒷자락을 잡지도 못하고 노출이 심할 듯 싶을 때만 핸드백으로 살짝 그 위치를 가리게 내 방법이다.
푸시맨이 간신히 집어넣어야 할 정도였다. 신도림역은 항상 만원이다
거의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며 푸쉬맨의 손길 속에서 지하철 안에 들어갔지만 내 뒤로도 더 들어왔고 도 그만큼 서로들이 밀팍되는 1호선.
두손에 백을 쥐고 가슴으로 모았다. 상대방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지만 아무래도 소매치기가 더 거슬리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치어 끙끙 거리는 신음이 들린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이 일을 매일같이 겪는 사람들이 못내 안스러웠다.
전화가 왔다. 간신히 백에서 꺼내 보니 남편이었다. 받고 싶지 않았다. 진동으로 해놓는 버릇 덕에 도로 백에 넣고는 다시 가슴께로 모으는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모든 쪽지에 답 못 드리고 몇몇 분에게만 답한거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