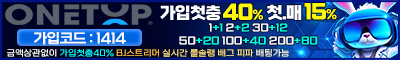내 젊은 날의 고해성사 - 14부
관리자
로맨스
0
4585
2018.12.23 14:16
< 사랑은
사랑에 빠진 이로 하여금
존재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눈멀게 하는 짙은 안개이다.
그리하여 우리들 마음은
산자락을 뛰어 다니는
휘청거리는 욕망의 환영만을 볼 수 있으며,
침묵의 계곡으로부터
소리 없는 아우성만을 들을 뿐이다. >
- 칼릴 지브란 -
...
평화롭게 잠든 녀석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해봤다.
여자.
내게 있어 여자는 무엇인가.
어머니?
나를 잉태하시고 날 낳아주신 여자.
할머니?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연초 대담배 냄새 절은 할머니의 삼베적삼을 헤집고
내가 만지며 놀았던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젖가슴.
내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시던 그 손길.
그리고 날 애지중지하신 고모님 두 분.
나를 받아주던 여자들.
내 열 일곱 첫 동정을 받아주던 고향 여자아이,
군대 가기 전 애인.
내게 사랑보다 먼저 성병을 안겨준 옆 동네 덕숙이,
여군하사, 그 선배인 손 하사,
옷가게 윤경이,
그리고 안방의 미연이...
...
어쩌면 다 하나같이 내게 자신을 희생한 여자들이다.
자신의 아픔보다 내 외로움을
내 못된 욕정을 달래주던 여자들...
그 한순간의 쾌락을 참지 못하여 내가 저지른 죄
언젠가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독한 형벌을 받으리라.
.....
.
상미는
빛이었다.
내가 그늘이라면 상미는 아름다운 빛이었다.
상미가 중학생일 때
나는 상미에게 그랬다.
"너는 하양나비다.
하양나비이기 때문에 하양나비의 꿈만 꿔야 한다."
상미는 눈부신 하얀빛을 내며 폴폴 꽃술을 찾아 날아다니는
희디흰 하양나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미가 발산하는 그 희디흰 빛이 내 그늘에 묻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상미에게는 그 희디흰 빛을 더 윤기 있게 해 줄
태양 같은 존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
다음날 아침.
녀석은 일어나면서부터 부산스러웠다.
"오빠! 어디 갈 건데? 응?"
"달성공원에 갈까? 앞산공원에 갈까?"
"두 군데 다가~ 그럼."
우리는 아침을 먹고 나섰다.
아침에 안방의 미연이 상미랑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미연은 시험 끝나서 고향으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미연과는 끝난 것도 만나는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였다.
아무튼 그녀에게는 조금 미련이 남아있었다.
아마도 그건,
섹스 때문이었을 거다.
..
달성공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돌아다녔다.
상미는 어린애처럼 좋아라 했다.
아이스크림 사달라, 솜사탕 사달라, 팝콘 먹고싶다 등등...
덩치는 말만한 녀석이 어린애가 된 듯 했다.
오후가 되어 우리는 봉무동에 있는 큰 저수지로 갔다.
거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다니던 대학의 여자친구랑 가봤던 곳이다.
대구 출신이었던 그녀가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었다.
저수지를 따라 한바퀴 도는 데 한시간 반 걸리는 곳이다.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길다란 수로를 따라 저수지로 가는 둑길,
저수지를 빙 돌아가는 오솔길과 산길이 아주 낭만적 곳이었다.
달성공원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면서 그 담엔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 저수지를 떠올렸다.
전에처럼 그 둑길을 걸으면서 나는 상미에게
수로의 풀 섶에 나있던 개구리밥풀과 땅가시나무 얘기...
<나는 당신이 걷는 길가의 이름 없는 풀...> 그런 시구도...
들려주었다.
그런데 참으로 알 수가 없었다.
유치하게도 난 예전의 애인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를 상미에게 하고 있었다.
그 풍경이 그 얘기를 꺼내게 했는지,
왜 그녀를 기억해 냈는지 알 수가 없었다.
.
그녀도 내가 끔찍이 아껴줬던 애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녀를 내 친구에게 빼앗겼다.
사귄지 서너 달만에 같은 과 친구녀석이
우리 사이에 끼어 들었고, 결국은 보기 좋게 빼앗겨 버렸다.
친구녀석은 나보다 한 살쯤인가 많았는데,
나중에 내가 군에 있을 동안 그 둘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녀석은 군대도 면제였다.
운도 좋은 녀석.
그녀도 내겐 빛나는 여자였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밝은 여자였다.
그때 나는 사랑한다는 고백 한 번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었다.
나의 우유부단함도 문제였지만,
그녀도 참으로 알 수가 없었다.
겉으로 보여지는 녀석의 <남자다움>에
그녀가 포획 당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랬다.
그건 납치나 강탈에 가까웠다.
녀석은 항상 대구시내에서 제법 논다고 하는 아이들을 거느리고,
학교보다는 학교 앞 당구장에 더 많이 가있던 녀석이었지만,
어떻든 내 애인을 가로채 갔다.
그녀와 이 저수지에 왔다간 그 주간 어느 날이던가.
그녀랑 내가 교문을 막 들어서는 순간 녀석의 일행들이 그녀를 데려갔고,
그 다음 며칠간도 그런 식이었다.
몇 달간 내가 그녀와 사귀는 것을 녀석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다 같은 과 동창사이라 나는 처음 그냥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다.
그녀도 살살 웃으며 내게로 왔다가 녀석에게로 갔다가 하더니,
어느 날부터 그들은 공식적으로 캠퍼스커플이 되어버렸다.
.
그녀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저수지.
근데 나는 왜 하필 거기로 상미를 데리고 갔을까.
..
저수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고즈넉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3면이 겹겹이 산으로 둘러 쌓인 저수지...
아름다웠다.
저수지를 반쯤 돌아가다가 우리는 평평한 잔디밭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5월의 오후 해가 저수지를 역광으로 비춰 내고 있었다.
게으른 봄바람이 수면을 타고 비늘처럼 반짝이면서
물비린내를 싣고 우리가 앉은 바로 앞 저수지 끝까지 와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솔 향기, 갖가지 풀 향기와 어우러져
더욱 알싸했다.
그 풍경을 마주하고 나란히 앉아있으려니 가슴까지 솔솔 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고향 얘기... 화실 얘기... 학교 얘기 등등.
..
가끔 상미는
무릎을 세워 무릎에 턱을 고이고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입가에는 보일 듯 보일 듯한 미소를 머금고 내 얘길 듣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고혹적이었다.
아아.
참으로 그랬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상미를 슬며시 껴안았고,
......... 껴안은 채 가만히,
그대로
한참이나 있었다.
워낙 애교가 많은 녀석이라
어릴 때부터 그 정도로 껴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다 큰 여대생이 되어서는 처음이었다.
지난밤에도 그저
잠든 녀석의 얼굴을 내려다 보다 잠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반듯한 상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
상미는 살포시 눈을 감았다.
..
그렇게도 재잘거리던 녀석이 다소곳이 눈을 감으니 더 숨이 막혀 왔다.
이마를 거쳐 짙은 녀석의 눈썹과 속눈썹을 지나
뺨을 지나 입술로 내려갔다.
.... 이어서
입술을 포개고 녀석의 입술을 열었다.
녀석은 긴장한 듯하면서도 서투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너무나 달콤한 키스였다.
그건 내 생애 가장 달콤한 키스였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