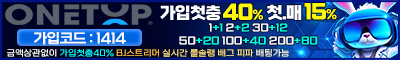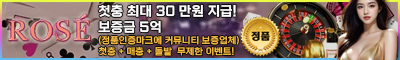친누나여서 미안해.. - 4부
관리자
근친
0
6778
2018.12.23 14:12
하얗게 뻗은 부드러운 다리가 내 다리와 엉켜 있었다. 부실하게 채운 단추 사이로 가슴의 굴곡이 드러났다. 그리고 레이스가 달린 하얀 브래지어도 보였다. 나는 누나를 흔들어 깨우려다 아차, 하고 손을 거뒀다. 그 녀석이 단단하게 일어서 있었다. 누나가 깨지 않도록 조심해서 팔을 뺐다.
저린 팔뚝으로 피가 몰리자 기묘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통증이 가라앉길 기다렸다. 베개를 잃은 누나의 몸이 뒤척였다. 왼다리가 더 위쪽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다리사이의 하얀 팬티가 언뜻 보였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렸다.
아픈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내는 누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거실로 빠져나왔다.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쐬고 머리를 긁적였다. 스물 일곱살의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란 어떤 존재일까. 샤워를 하고 아침준비를 했다. 북어국을 끓이면서 누나방문을 흘깃 보았는데 누나는 아직 못 일어난 것 같았다.
누나가 술 먹은 다음날 아침, 그 날이 일요일인 경우엔 보통 나 혼자 아침을 먹게 된다. 오늘도 혼자 꾸역꾸역 밥풀을 밀어넣고는 티비를 틀었다. 소파에 앉아 아침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시계바늘은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누나 방쪽에서 `달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누나가 걸어 나왔다.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하는 누나는 아직도 하얀 셔츠차림이었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오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몇 모금 마시다가 나를 보았다.
“병우야… 오늘은 도서관 안가?”
“…….”
“병우야…?”
“아? 어…. 오늘은 그냥 쉬려구…”
“그래… 가끔은 속도를 조절해주는 게 좋아.”
나는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책을 뒤적거렸다. 누나는 나를 향해 돌아선 채로 물을 먹고 있었다. 얼굴을 돌리지 않아도 자꾸 힐끔거려지는 눈동자 때문에 누나의 하얀 다리가 아른거렸다.
“……내 차림이 이상하니?”
누나는 부끄러운지 양손으로 셔츠 밑단을 잡아 늘이며 웃고 있었다.
“아, 아니. 나는 괜찮아.”
괜찮다니. 뭐가?
누나가 입을 가리고 웃기 시작했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리모콘을 들고 정신없이 티비채널을 돌렸다. 누나가 그런 나를 보면서 질문했다.
“우리 어디 놀러가지 않을래?”
“어디를? 둘이서?”
“너 말구 누가 또 있니?”
“…….”
나는 잠이 깬 누나를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다. 하늘하늘 풀어헤친 머리에서부터 잘록한 허리를 지나 숨막히게 하얀 다리와 아기자기한 발가락까지.
저린 팔뚝으로 피가 몰리자 기묘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통증이 가라앉길 기다렸다. 베개를 잃은 누나의 몸이 뒤척였다. 왼다리가 더 위쪽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다리사이의 하얀 팬티가 언뜻 보였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렸다.
아픈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내는 누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거실로 빠져나왔다.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쐬고 머리를 긁적였다. 스물 일곱살의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란 어떤 존재일까. 샤워를 하고 아침준비를 했다. 북어국을 끓이면서 누나방문을 흘깃 보았는데 누나는 아직 못 일어난 것 같았다.
누나가 술 먹은 다음날 아침, 그 날이 일요일인 경우엔 보통 나 혼자 아침을 먹게 된다. 오늘도 혼자 꾸역꾸역 밥풀을 밀어넣고는 티비를 틀었다. 소파에 앉아 아침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시계바늘은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누나 방쪽에서 `달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누나가 걸어 나왔다.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하는 누나는 아직도 하얀 셔츠차림이었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오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몇 모금 마시다가 나를 보았다.
“병우야… 오늘은 도서관 안가?”
“…….”
“병우야…?”
“아? 어…. 오늘은 그냥 쉬려구…”
“그래… 가끔은 속도를 조절해주는 게 좋아.”
나는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책을 뒤적거렸다. 누나는 나를 향해 돌아선 채로 물을 먹고 있었다. 얼굴을 돌리지 않아도 자꾸 힐끔거려지는 눈동자 때문에 누나의 하얀 다리가 아른거렸다.
“……내 차림이 이상하니?”
누나는 부끄러운지 양손으로 셔츠 밑단을 잡아 늘이며 웃고 있었다.
“아, 아니. 나는 괜찮아.”
괜찮다니. 뭐가?
누나가 입을 가리고 웃기 시작했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리모콘을 들고 정신없이 티비채널을 돌렸다. 누나가 그런 나를 보면서 질문했다.
“우리 어디 놀러가지 않을래?”
“어디를? 둘이서?”
“너 말구 누가 또 있니?”
“…….”
나는 잠이 깬 누나를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다. 하늘하늘 풀어헤친 머리에서부터 잘록한 허리를 지나 숨막히게 하얀 다리와 아기자기한 발가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