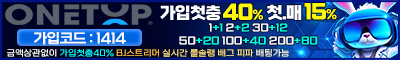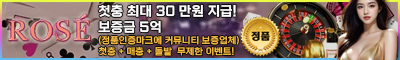불륜의 나락- 시아버지에게서 ... - 3부
관리자
근친
0
15889
2018.12.23 14:10
시아버지인 만복의 과의 격렬한 섹스를 끝낸 지희가 숨을 고르며 문득 오래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마지못해 시아버지에 당하던 장면들을 머리에 떠올린다.
“바로 정육점 뒤 골목으로 나와라.”
“네?”
저녁 설거지를 하던 지희는 깜짝 놀라며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대충 끝내고 시방 바로 나오라고.”
“아..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너, 큰 소리 내면 워쩔라구 이러냐? 빨리 끝낼 것잉게 서둘러 나와라~잉?”
장기나 두러 간다며 너스레를 떨며 나가는 시아버지의 뒷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지희는 난감하기만 하다.
식구들이 알게 될까 무서워 몇 번 마지 못해 응해 주었는데 요사이엔 이틀이 멀다
하고 저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군다.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벌써 몇 주째 지희는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26살까지도 순결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 생활만을 하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남편은 첫 순결을 뺏어 결혼까지 하더니 이젠 시아버지가 자신을 탐하고 있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하다.
설거지를 대충 마무리 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는 마루로 갔다.
“어머니, 저 요 앞에 잠깐 다녀 올께요.”
“이 밤 중에 뭐 하러 어딜 간다고?”
“아.. 예.. 저기.. 수퍼 언니가 잠깐 보자고 해서요..”
“걔는 만날 왜 그렇게 불러 낸대냐? 수다 작작들 떨고 일찍 들어와 자.”
“네에..”
허둥대며 집을 빠져 나오는데 전기공으로 공사 현장에 나가는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다
컴컴한 골목을 지나 정육점을 끼고 돌아서자 기다리고 있던 시아버지가 지희를 와락 끌어 안는다.
“아.. 아버님..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헙!”
만복이 지희의 입술을 덮쳤다.
며느리의 입술을 빨던 만복의 두툼한 입술 사이로 끈적한 타액을 묻힌 혀가 지희의 입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후..훕..”
순간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몸을 떼었고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지희와는 달리 시아버지인 만복은 사람이 골목을 지나 안보이게 될 때까지 의미 모를 말들을 중얼 거리고 있었다.
“응, 그려 그래 가지고 말이다 니가 어쩌고 저쩌고…”
행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만복은 지희의 손을 끌어 골목을 빠져나온다.
“여기선 안되겄다. 놀이터 쪽으로 가자.”
“아버님~ 안 하면 안돼요? 네? 제발요…”
“여 까지 나와 가지고 이게 뭔 말이여. 군소리 말고 따라 오니라.”
지희는 시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놀이터 한 쪽 구석에 있는 미끄럼틀 아래 컴컴한 곳으로 들어갔고 도착하기가 무섭게 만복이 지희의 잘록한 허리를 끌어 안으며 다시 입을 덮쳤다.
“웁..웁..”
급했는지 만복의 손이 서둘러 지희의 치마자락을 걷어 올렸고 이내 그 손은 부여 잡고 버티는 지희의 흰 손을 뿌리치며 하얀 팬티를 아래로 끌어 내리고 있었다.
계곡 사이 무성한 숲을 헤치며 질 입구를 찾아낸 만복의 손은 이내 꽉 다물고 있는 지희의 질 속을 억지로 파고 들었고 지희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엉덩이만 뒤로 빼며 가냘프게 저항하고 있었다.
마주보고 서서 지희의 질 속을 쑤셔대던 만복이 다른 손으로 지희의 팔을 잡아 이미 지퍼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자신의 자지에 가져갔다.
“아..아버님..안..안돼요…아아..”
“가만히 안 있어? 콱! 그냥. 얼른 잡아봐. 얼른!!”
만복이 소리를 지르자 지희는 깜짝 놀라며 엉겁결에 만복의 우람한 자지를 움켜 쥔다.
너무 컸다. 남편의 것 보다 몇 배는 더 큰 것 같다.
“뭐혀? 잡고 흔들지 않고. 아 얼른!”
지희는 두려움에 떨며 만복의 자지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으메 좋은거. ..”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는지 이내 만복이 지희를 돌려 세워 미끄럼틀 기둥을 잡게 하고는 엉덩이를 뒤로 빼더니 순식간에 자기의 자지를 지희의 엉덩이 사이로 밀어 넣었다.
“아..안왜요..아..아버…헉!!!”
“퍽..퍽..척..척..”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무 뒤에서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만복의 펌프질은 계속 됐고 철퍼덕 거리는 소리가 놀이터를 돌아 컴컴한 하늘로 퍼져 올라가고 있었다.
“점심은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꺼나?”
귀에다 속삭이는 만복의 소리에 지희가 감았던 눈을 뜨며 만복을 돌아 봤다.
벽시계가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정육점 뒤 골목으로 나와라.”
“네?”
저녁 설거지를 하던 지희는 깜짝 놀라며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대충 끝내고 시방 바로 나오라고.”
“아..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너, 큰 소리 내면 워쩔라구 이러냐? 빨리 끝낼 것잉게 서둘러 나와라~잉?”
장기나 두러 간다며 너스레를 떨며 나가는 시아버지의 뒷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지희는 난감하기만 하다.
식구들이 알게 될까 무서워 몇 번 마지 못해 응해 주었는데 요사이엔 이틀이 멀다
하고 저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군다.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벌써 몇 주째 지희는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26살까지도 순결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 생활만을 하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남편은 첫 순결을 뺏어 결혼까지 하더니 이젠 시아버지가 자신을 탐하고 있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하다.
설거지를 대충 마무리 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는 마루로 갔다.
“어머니, 저 요 앞에 잠깐 다녀 올께요.”
“이 밤 중에 뭐 하러 어딜 간다고?”
“아.. 예.. 저기.. 수퍼 언니가 잠깐 보자고 해서요..”
“걔는 만날 왜 그렇게 불러 낸대냐? 수다 작작들 떨고 일찍 들어와 자.”
“네에..”
허둥대며 집을 빠져 나오는데 전기공으로 공사 현장에 나가는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다
컴컴한 골목을 지나 정육점을 끼고 돌아서자 기다리고 있던 시아버지가 지희를 와락 끌어 안는다.
“아.. 아버님..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헙!”
만복이 지희의 입술을 덮쳤다.
며느리의 입술을 빨던 만복의 두툼한 입술 사이로 끈적한 타액을 묻힌 혀가 지희의 입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후..훕..”
순간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몸을 떼었고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지희와는 달리 시아버지인 만복은 사람이 골목을 지나 안보이게 될 때까지 의미 모를 말들을 중얼 거리고 있었다.
“응, 그려 그래 가지고 말이다 니가 어쩌고 저쩌고…”
행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만복은 지희의 손을 끌어 골목을 빠져나온다.
“여기선 안되겄다. 놀이터 쪽으로 가자.”
“아버님~ 안 하면 안돼요? 네? 제발요…”
“여 까지 나와 가지고 이게 뭔 말이여. 군소리 말고 따라 오니라.”
지희는 시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놀이터 한 쪽 구석에 있는 미끄럼틀 아래 컴컴한 곳으로 들어갔고 도착하기가 무섭게 만복이 지희의 잘록한 허리를 끌어 안으며 다시 입을 덮쳤다.
“웁..웁..”
급했는지 만복의 손이 서둘러 지희의 치마자락을 걷어 올렸고 이내 그 손은 부여 잡고 버티는 지희의 흰 손을 뿌리치며 하얀 팬티를 아래로 끌어 내리고 있었다.
계곡 사이 무성한 숲을 헤치며 질 입구를 찾아낸 만복의 손은 이내 꽉 다물고 있는 지희의 질 속을 억지로 파고 들었고 지희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엉덩이만 뒤로 빼며 가냘프게 저항하고 있었다.
마주보고 서서 지희의 질 속을 쑤셔대던 만복이 다른 손으로 지희의 팔을 잡아 이미 지퍼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자신의 자지에 가져갔다.
“아..아버님..안..안돼요…아아..”
“가만히 안 있어? 콱! 그냥. 얼른 잡아봐. 얼른!!”
만복이 소리를 지르자 지희는 깜짝 놀라며 엉겁결에 만복의 우람한 자지를 움켜 쥔다.
너무 컸다. 남편의 것 보다 몇 배는 더 큰 것 같다.
“뭐혀? 잡고 흔들지 않고. 아 얼른!”
지희는 두려움에 떨며 만복의 자지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으메 좋은거. ..”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는지 이내 만복이 지희를 돌려 세워 미끄럼틀 기둥을 잡게 하고는 엉덩이를 뒤로 빼더니 순식간에 자기의 자지를 지희의 엉덩이 사이로 밀어 넣었다.
“아..안왜요..아..아버…헉!!!”
“퍽..퍽..척..척..”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무 뒤에서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만복의 펌프질은 계속 됐고 철퍼덕 거리는 소리가 놀이터를 돌아 컴컴한 하늘로 퍼져 올라가고 있었다.
“점심은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꺼나?”
귀에다 속삭이는 만복의 소리에 지희가 감았던 눈을 뜨며 만복을 돌아 봤다.
벽시계가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