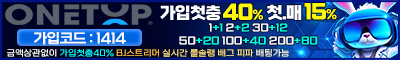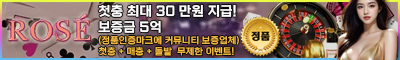편리한 여자친구_SM - 2부 1장
관리자
SM
0
4315
2019.05.01 05:24
믿기 힘드시겠지만, "편리한 여자친구_SM"은 나름 로맨스물이랍니다 ㅋㅋ
===============================================================
6.
J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주인님. 자위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낸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답장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100년은 되는 것 같다.
띠링, 소리가 남과 거의 동시에 J는 허겁지겁 비번을 누른다. N의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
[안돼. 이제 두 시간 있으면 만날 거잖아. 참아.]
J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시무룩해진다. 띠링, 또 다른 N의 문자.
[너 만났을 때 팬티 젖어 있으면 보지 찢어버린다.]
주인님, 그건 무리에요. J는 생각했다. J는 이미 N의 모든 것에 젖어버리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N의 얼굴을 대할 때는 물론 동작, 목소리, 심지어 문자에도
흥분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N은 그런 J를 진정한 암캐라며 칭찬했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시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이다.
주인과 암캐.
언제나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던 J였다. 유난히 자존심도 강해서,
남자를 휘두르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강한 성격의 아가씨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J는 생각도 계산도 하지 않는다. N을 만날 때면,
J는 그저 한 마리의 암캐이자 성노예일 뿐, 생각할 권리 따윈 없는 것이다.
아! 이런 해방감이라니! J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번진다.
그 후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J는
N의 오피스텔로 달려간다. N의 오피스텔은 방 하나가 딸린 주거형으로,
깔끔하고 조용했다. N은 먼지가 쌓이는 게 싫다며 액자도 장식품도 놓지 않았다.
약간 썰렁했지만 그것이 외려 N 답다고 J는 생각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J를 보며 N가 정답게 말한다.
“우리 럭키 왔어?”
“네- 주인님!”
“배고프지? 밥 먹자.”
J는 쇼파 위에 옷을 벗어 차곡차곡 개 놓는다. 커다란 베란다 창문 때문에
건너편 오피스텔에선 분명 불 켜진 마루가 훤히 들여다보일 것이다.
하지만 J는 아랑곳없이 알몸이 된다. 그리고 커다란 엉덩이와 토실토실한 보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식탁으로 기어간다.
“오늘은 생선인데…….”
N은 식탁에 차려진 삼치구이를 들어 뼈를 발라낸다. 세심한 손놀림이다.
“우리 럭키 목에 생선가시 걸리면 안 되지…….”
손을 모으고 바닥에 엎드린 J의 앞에 한입 크기로 찢은 생선살과 쌀밥,
그리고 김치가 놓여진다. 물론 그것들은 플라스틱 개밥그릇 속에서 먹기 좋게 뒤섞여 있다.
“잘 먹겠습니다, 주인님!”
J은 개밥그릇에 코를 박고 입으로만 밥을 먹는다.
개는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찹찹 소리와 함께 개밥그릇은 어느 새 텅 비었다.
“목마르냐?”
“네, 주인님.”
N은 벨트를 푼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빈 개밥그릇에 노란 액체가 차오른다.
J는 N에게 고개를 조아려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밥그릇에 얼굴을 박는다.
잠시 뒤 J가 고개를 들자, 파란 플라스틱 밥그릇은 다시 비어 있다.
N의 소변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신 것이다.
“좋았어. 잘했어, 럭키.”
J는 기쁜 기색으로 N의 다리에 몸을 비빈다.
식사를 마친 N은 J의 목에 개목걸이를 맸다. 동그랗고 순진해 보이는 J의 얼굴에
검은 가죽 개목걸이는 어색한 동시에 묘하게 어울린다.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는 그렇게 오줌을 잘 먹는단 말이지…….”
N은 거실의 조명을 더욱 밝힌다. 이제 N의 오피스텔 거실은 무대만큼이나 환하다.
목걸이를 잡아 끄는 N을 따라, J는 알몸으로 거실 여기저기를 기어 다닌다.
J의 숨결이 점점 가빠진다. 건너편 오피스텔을 곁눈질해본다.
몇몇 집 베란다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해본다. 보지가 감전된 것처럼 짜릿짜릿하다.
“또 질질 흘리고 자빠졌네…….”
N의 중얼거림에 J는 퍼뜩 정신이 든다. 과연 어느 새 보짓물이 허벅지를 타고 흐르고 있다.
오줌의 뒷맛으로 찝찔한 입 안에도 침이 고여오기 시작한다.
“럭키는 진짜 잘 젖는다. 그래서 맘에 들어.”
“감사합니다, 주인님.”
N은 J의 목줄을 끌고 베란다 앞으로 다가간다. 드륵, 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깥 공기가 거실 안으로 밀려온다. J의 몸에 총총 닭살이 올라온다.
“우리 럭키 시력 좋지? 저기 건너편 오피스텔에 몇 명이나 베란다에 나와 있어?”
“여섯 명....... 아니, 일곱 명 정도요.”
“럭키 쳐다보고 있어?”
J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딜 보고
있는지는 알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더욱 더 젖어버리는 J였다.
“손목 내밀어.”
J는 순순히 오른손을 내밀었다. 철컥, 차가운 촉감의 금속이 J의 손목에 감긴다.
수갑이다. N은 수갑을 베란다 난간에 통과시키더니 J의 왼손에도 채웠다.
J는 순식간에 베란다 난간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 주인님…….”
“잠깐 그러고 있어. 주인님 잠깐 슈퍼 좀 다녀올 테니.”
“네? 주인님! 용서해주세요……. 네?”
“뭔 소리야? 누가 너 벌 준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주인님 기다리면서 있으면 돼.”
하지만 이래선 훤하게 보이잖아요! J는 힘겹게 말을 삼켰다.
창문까지 활짝 열었으니 건너편 집들 뿐 아니라 건물 밖 야외에서도
J의 알몸은 너무나도 잘 보일 것이었다. 개목걸이 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J의 몸에 온통 닭살이 일어났다.
“춥냐?”
“네… 주인님. 너무 추워요.”
“참아.”
그리고 N은 정말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거실은 여전히 대낮처럼 환하다.
당황한 J는 눈을 들어 건너편 오피스텔의 동정을 살핀다. 일곱 명? 여덟 명?
어째 아까보다 늘어난 것 같다. 게다가 두 사람이 나란히 베란다에 나와 있는
한 집에선 어딘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히 날 보고 있는 걸 거야!
‘모두 내 몸을 보고 있어!’
그 때였다. 삑삑삑, 현관에서 전자음이 들렸다. N이 돌아온 것이다.
방 안으로 들어온 N은 덜덜 떨면서 애처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J에게 말했다.
“깜빡 했네. 우리 J 보지에다가 좋은 거 박아줘야지.”
N은 방에서 흰색 진동 딜도를 가지고 나왔다.
N은 좀처럼 J의 보지에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딜도를 애용하곤 했다.
딜도는 J의 보지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쑤욱 밀려들어간다.
“흐으으응….”
“개년. 좋냐?”
“네… 네… 주인님……”
N은 딜도의 스위치를 올린다. 드르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딜도가 사정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으으흑! 아흐응…….”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암캐답게.”
N은 그대로 집을 나섰다.
N이 집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0분은 족히 흐른 뒤였다.
물론 그 사이 J의 상태는 말 그대로 가관이 되어 있었다.
“힉! 너 이게 뭐야. 설마 오줌 쌌냐?”
“죄송해요 주인님……. 럭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죄송해요…….”
사람들 앞에서 알몸을 보이며 보지 가득 딜도를 받아들였던 J는
그만 절정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뱃속을 채우고 있던
따끈한 액체도 베란다 바닥에 흘려버렸다.
N은 여전히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J의 다리를 걷어찬다.
J는 그만 자신이 싸 놓은 오줌 위로 주저앉았다.
“흐으윽….흑흑…….”
닭똥 같은 눈물이 J의 눈에서 흘러내린다. 건전지가 다 되었는지, 딜도는 멈춰 있다.
N는 밭에서 무를 뽑듯 J의 보지에서 딜도를 쑤욱 뽑아냈다.
크게 벌어진 J의 보지를 보며 N가 중얼거렸다.
“럭키 이년은 보지도 걸레 씹창이고…… 아무데서나 오줌 싸지르고……
내가 이런 더러운 년을 계속 길러야겠냐?”
“흑흑… 주인님, 럭키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네?”
J의 눈물로 얼룩덜룩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N은 짜릿한 희열을 느낀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보지도, 오줌으로 범벅 된 다리도 참을 수 없이 좋다.
하지만 N은 짐짓 표정을 숨긴다. 자신의 차가운 태도에 안절 부절하는
J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기 때문이다.
“쌍년. 침실로 따라와.”
===============================================================
6.
J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주인님. 자위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낸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답장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100년은 되는 것 같다.
띠링, 소리가 남과 거의 동시에 J는 허겁지겁 비번을 누른다. N의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
[안돼. 이제 두 시간 있으면 만날 거잖아. 참아.]
J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시무룩해진다. 띠링, 또 다른 N의 문자.
[너 만났을 때 팬티 젖어 있으면 보지 찢어버린다.]
주인님, 그건 무리에요. J는 생각했다. J는 이미 N의 모든 것에 젖어버리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N의 얼굴을 대할 때는 물론 동작, 목소리, 심지어 문자에도
흥분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N은 그런 J를 진정한 암캐라며 칭찬했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시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이다.
주인과 암캐.
언제나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던 J였다. 유난히 자존심도 강해서,
남자를 휘두르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강한 성격의 아가씨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J는 생각도 계산도 하지 않는다. N을 만날 때면,
J는 그저 한 마리의 암캐이자 성노예일 뿐, 생각할 권리 따윈 없는 것이다.
아! 이런 해방감이라니! J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번진다.
그 후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J는
N의 오피스텔로 달려간다. N의 오피스텔은 방 하나가 딸린 주거형으로,
깔끔하고 조용했다. N은 먼지가 쌓이는 게 싫다며 액자도 장식품도 놓지 않았다.
약간 썰렁했지만 그것이 외려 N 답다고 J는 생각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J를 보며 N가 정답게 말한다.
“우리 럭키 왔어?”
“네- 주인님!”
“배고프지? 밥 먹자.”
J는 쇼파 위에 옷을 벗어 차곡차곡 개 놓는다. 커다란 베란다 창문 때문에
건너편 오피스텔에선 분명 불 켜진 마루가 훤히 들여다보일 것이다.
하지만 J는 아랑곳없이 알몸이 된다. 그리고 커다란 엉덩이와 토실토실한 보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식탁으로 기어간다.
“오늘은 생선인데…….”
N은 식탁에 차려진 삼치구이를 들어 뼈를 발라낸다. 세심한 손놀림이다.
“우리 럭키 목에 생선가시 걸리면 안 되지…….”
손을 모으고 바닥에 엎드린 J의 앞에 한입 크기로 찢은 생선살과 쌀밥,
그리고 김치가 놓여진다. 물론 그것들은 플라스틱 개밥그릇 속에서 먹기 좋게 뒤섞여 있다.
“잘 먹겠습니다, 주인님!”
J은 개밥그릇에 코를 박고 입으로만 밥을 먹는다.
개는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찹찹 소리와 함께 개밥그릇은 어느 새 텅 비었다.
“목마르냐?”
“네, 주인님.”
N은 벨트를 푼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빈 개밥그릇에 노란 액체가 차오른다.
J는 N에게 고개를 조아려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밥그릇에 얼굴을 박는다.
잠시 뒤 J가 고개를 들자, 파란 플라스틱 밥그릇은 다시 비어 있다.
N의 소변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신 것이다.
“좋았어. 잘했어, 럭키.”
J는 기쁜 기색으로 N의 다리에 몸을 비빈다.
식사를 마친 N은 J의 목에 개목걸이를 맸다. 동그랗고 순진해 보이는 J의 얼굴에
검은 가죽 개목걸이는 어색한 동시에 묘하게 어울린다.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는 그렇게 오줌을 잘 먹는단 말이지…….”
N은 거실의 조명을 더욱 밝힌다. 이제 N의 오피스텔 거실은 무대만큼이나 환하다.
목걸이를 잡아 끄는 N을 따라, J는 알몸으로 거실 여기저기를 기어 다닌다.
J의 숨결이 점점 가빠진다. 건너편 오피스텔을 곁눈질해본다.
몇몇 집 베란다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해본다. 보지가 감전된 것처럼 짜릿짜릿하다.
“또 질질 흘리고 자빠졌네…….”
N의 중얼거림에 J는 퍼뜩 정신이 든다. 과연 어느 새 보짓물이 허벅지를 타고 흐르고 있다.
오줌의 뒷맛으로 찝찔한 입 안에도 침이 고여오기 시작한다.
“럭키는 진짜 잘 젖는다. 그래서 맘에 들어.”
“감사합니다, 주인님.”
N은 J의 목줄을 끌고 베란다 앞으로 다가간다. 드륵, 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깥 공기가 거실 안으로 밀려온다. J의 몸에 총총 닭살이 올라온다.
“우리 럭키 시력 좋지? 저기 건너편 오피스텔에 몇 명이나 베란다에 나와 있어?”
“여섯 명....... 아니, 일곱 명 정도요.”
“럭키 쳐다보고 있어?”
J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딜 보고
있는지는 알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더욱 더 젖어버리는 J였다.
“손목 내밀어.”
J는 순순히 오른손을 내밀었다. 철컥, 차가운 촉감의 금속이 J의 손목에 감긴다.
수갑이다. N은 수갑을 베란다 난간에 통과시키더니 J의 왼손에도 채웠다.
J는 순식간에 베란다 난간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 주인님…….”
“잠깐 그러고 있어. 주인님 잠깐 슈퍼 좀 다녀올 테니.”
“네? 주인님! 용서해주세요……. 네?”
“뭔 소리야? 누가 너 벌 준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주인님 기다리면서 있으면 돼.”
하지만 이래선 훤하게 보이잖아요! J는 힘겹게 말을 삼켰다.
창문까지 활짝 열었으니 건너편 집들 뿐 아니라 건물 밖 야외에서도
J의 알몸은 너무나도 잘 보일 것이었다. 개목걸이 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J의 몸에 온통 닭살이 일어났다.
“춥냐?”
“네… 주인님. 너무 추워요.”
“참아.”
그리고 N은 정말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거실은 여전히 대낮처럼 환하다.
당황한 J는 눈을 들어 건너편 오피스텔의 동정을 살핀다. 일곱 명? 여덟 명?
어째 아까보다 늘어난 것 같다. 게다가 두 사람이 나란히 베란다에 나와 있는
한 집에선 어딘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히 날 보고 있는 걸 거야!
‘모두 내 몸을 보고 있어!’
그 때였다. 삑삑삑, 현관에서 전자음이 들렸다. N이 돌아온 것이다.
방 안으로 들어온 N은 덜덜 떨면서 애처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J에게 말했다.
“깜빡 했네. 우리 J 보지에다가 좋은 거 박아줘야지.”
N은 방에서 흰색 진동 딜도를 가지고 나왔다.
N은 좀처럼 J의 보지에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딜도를 애용하곤 했다.
딜도는 J의 보지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쑤욱 밀려들어간다.
“흐으으응….”
“개년. 좋냐?”
“네… 네… 주인님……”
N은 딜도의 스위치를 올린다. 드르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딜도가 사정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으으흑! 아흐응…….”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암캐답게.”
N은 그대로 집을 나섰다.
N이 집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0분은 족히 흐른 뒤였다.
물론 그 사이 J의 상태는 말 그대로 가관이 되어 있었다.
“힉! 너 이게 뭐야. 설마 오줌 쌌냐?”
“죄송해요 주인님……. 럭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죄송해요…….”
사람들 앞에서 알몸을 보이며 보지 가득 딜도를 받아들였던 J는
그만 절정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뱃속을 채우고 있던
따끈한 액체도 베란다 바닥에 흘려버렸다.
N은 여전히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J의 다리를 걷어찬다.
J는 그만 자신이 싸 놓은 오줌 위로 주저앉았다.
“흐으윽….흑흑…….”
닭똥 같은 눈물이 J의 눈에서 흘러내린다. 건전지가 다 되었는지, 딜도는 멈춰 있다.
N는 밭에서 무를 뽑듯 J의 보지에서 딜도를 쑤욱 뽑아냈다.
크게 벌어진 J의 보지를 보며 N가 중얼거렸다.
“럭키 이년은 보지도 걸레 씹창이고…… 아무데서나 오줌 싸지르고……
내가 이런 더러운 년을 계속 길러야겠냐?”
“흑흑… 주인님, 럭키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네?”
J의 눈물로 얼룩덜룩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N은 짜릿한 희열을 느낀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보지도, 오줌으로 범벅 된 다리도 참을 수 없이 좋다.
하지만 N은 짐짓 표정을 숨긴다. 자신의 차가운 태도에 안절 부절하는
J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기 때문이다.
“쌍년. 침실로 따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