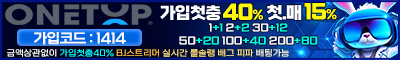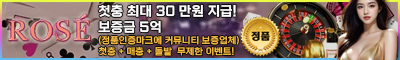우울한 날의 광시곡 - 11부
관리자
로맨스
0
4850
2018.12.23 14:16
기정과 은수의 동상이몽속의 외줄타기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서로 PC방 카운터를 교대했을 때를 틈타 일주일에 두 세 번 씩 석채와 미스정을 만나 밀회를 즐겼다.
석채는 다시는 별다방을 찾지 않았고, 미스정도 기정을 따먹은(?) 뒤로 돈을 좇아 가랑이를 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신의 불륜이 상대방에게 들키면 부부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이 두려웠다.
비록 각각 바람을 피우는 처지일망정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헤어지는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기정은 미스정에게, 은수는 석채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아………….아…좋아”
기정의 위에 올라탄 채 그의 물건을 자신의 보지 안에 깊이 감춘 미스정의 방아찧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삽인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베개를 겹쳐 베서 자신의 머리를 높게 만든 기정의 눈에 애액으로 번들거리는 물건이 미스정의 음모 아래쪽에서 솟구치듯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였다.
“오빠 좋아?….좋아?…………….아…. 좋아”
미스정이 특유의 비음을 내뿜어가며 소리를 질러댔다.
기정에게 묻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흥분을 이길 길이 없어 내뱉는 말이었다.
“아…아…미스정 미칠 것 같아”
“아직…싸지 마….오빠 좋아??…………….아…..미쳐”
마치 자신의 자궁벽까지 뚫어버리려는 것처럼 미스정은 기정의 귀두 끝이 거의 드러날 정도까지 몸을 올렸다가는 뿌리 끝까지 잠길 정도로 힘차게 내리찍었다.
한번 내리찍을 때마다 엄청난 크기의 유방이 흔들거리며 가슴 위에서 파도를 쳤다.
“철퍽…철퍽”
땀과 애액이 질펀하게 얽혀있는 두 사람의 삽입부분은 살끼리 마주칠 때마다 한낮의 모텔 방안에 묘한 음향을 만들어 냈다.
“아학…오빠…나 죽어!!!”
어느 순간 미스정의 질벽이 강하게 기정의 물건을 옭조였다.
질안에 만들어진 엄청난 애액의 홍수 속에서 수영하듯 자연스럽게 오가던 기정의 물건에 강한 자극이 왔다.
“아….싼다”
기정의 물건이 울컥하며 소방호스가 물을 뿜듯 정액을 쏟아냈다.
“하악….나도”
미스정의 앞으로 상체가 무너지며 기정의 상체와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버렸다.
미스정의 젖가슴 사이 계곡으로 흘러내리던 땀이 배꼽 부근에서 방울을 이루더니 기정의 배 위로 떨어져 내렸다.
미스정이 기정의 위에 엎드린 채 질을 힘껏 조였다.
마지막 남은 정액이 기정의 귀두 끝을 빠져나와 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항문 근처에 이르자 침대 시트위로 떨어졌다.
기정의 사타구니 아래는 이미 애액과 정액으로 마치 오줌을 싼 것 마냥 흠뻑 젖어 있었다.
“후…우”
두 사람의 결합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미스정이 조심스럽게 답배를 집어주자 기정은 불을 붙여 함모금 힘껏 빨았다.
사정의 후의 나른함이 밀려들었다.
몸매, 얼굴 어느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은수를 아내로 두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성적 매력이 미스정에게서는 물씬 흘러 나왔다.
사실 은수도 미스정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뜨거운 여자였지만 두 사람의 소극적인 잠자리가 서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못하게 만든 것 뿐이었다.
석채를 통해 은수도 섹스의 마력을 느꼈지만 기정은 여전히 은수가 섹스에 대해서는 그저 그런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섹스 머신 같은 미스정을 만났으니 손쉽게 빠져든 것은 당연했다.
그럴수록 은수에게 들킬 가능성은 높아져갔고, 걱정도 됐지만 이젠 일주일에 적어도 두 세번 이상 미스정을 만나지 않으면 몸살이 날 듯 했다.
같은 시간에 석채는 기정의 PC방에 있었다.
온라인 고스톱을 치면서 카운터의 은수를 훔쳐보고 있었지만 둘만 빠져 나올 방법이 없었다.
은수는 기정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고 말했지만 석채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별다방에 전화했을 때 미스정은 여섯 시간짜리 장기 티켓을 끊은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제 두 시간이 지났으니 기정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네 시간이나 남았다.
그러나 오늘따라 PC방은 거의 꽉 찼고 은수는 몸을 뺄 시간조차 없어보였다.
정신이 딴 데로 팔려있으니 고스톱 머니는 자꾸 줄어들어갔다.
안타까운건 은수도 마찬가지였다.
건녀편에서 석채가 눈빛을 보낼 때마다 아랫부분이 젖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은수는 카운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랑이 부분을 만져보았다.
하필이면 몸에 꼭 끼는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만지기도 불편했다.
얼마나 물이 흘렀는지 청바지 바깥쪽까지 젖어있는 것이 느껴졌다.
“은수씨 난데요. 듣기만 하세요”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된 석채는 카운터로 전화를 걸었다.
얼굴이 상기된 채 석채를 넘겨다 보는 은수의 모습이 보였다.
“카운터 맡길만한 사람 없어요?”
“저 쪽에 단골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은수는 누가 들을세라 작게 속삭였다.
“그럼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네”
전화를 끊은 은수는 열심히 채팅중인 단골 학생에게 다가갔다.
“학생 잠깐만 카운터 봐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응, 나 화장실이 급해서….10분이면 돼”
“그럴께요”
카운터로 돌아가면서 은수가 석채에게 눈을 찡긋해보였다.
석채는 카운터 앞의 과자 판매대에서 과자를 고르는 척 하다가 슬며서 카운터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은수가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엉켰다.
석채가 입을 갖다대자마자 은수가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열었다.
“하…아”
은수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했다.
석채는 키스를 하면서 선 채로 정신없이 은수의 옷을 벗겼다.
얇은 티셔츠와 브래지어뿐인 상의는 쉽게 벗겼지만 타이트한 청바지는 잘 벗겨지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 골반에 걸린 청바지를 벗기는 손이 자꾸 빗나갔다.
은수가 다리를 들어 도와주면서 간신히 청바지가 은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은수의 입술에서 얼굴을 뗀 석채가 청바지를 살폈다.
어디에선가 축축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청바지의 갈라지는 부분이 오줌 싼 것 처럼 젖어 있었다.
“보지 마세요”
석채가 뭘 보는지 알아챈 은수가 얼굴을 붉히며 뺏을 듯이 손을 뻗쳤다.
“은수씨 급했나봐요…하하하”
석채는 웃으며 청바지를 구석으로 던지고는 은수의 팬티로 손을 가져갔다.
아무 무늬도 없는 하늘색 팬티는 이미 흠뻑 젖어있었다.
젖은 팬티 너머로 마치 도끼자국처럼 갈라진 부분이 선명히 드러났고, 그 위로 검은색 음모가 살짝 비쳤다.
“빨리요. 금방 나가봐야 해요”
은수는 이제 창피함보다도 뜨거워진 몸을 달래는 것이 더 급해졌다.
적극적으로 양손을 석채 목뒤로 넘겨 석채의 입술을 찾았다.
석채는 은수의 혀를 받아들이며 두 손으로는 은수의 팬티를 벗겨 내렸다.
흘러내린 팬티가 은수의 미끈한 다리위로 미끌어지다 발목에 걸렸다.
음모 아래쪽으로 손을 대자 미끈한 액체가 손안에 가득 만져졌다.
은수의 옷을 모두 벗긴 석채는 서둘러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
두 사람의 혀는 여전히 상대방의 입안을 오가고 있는 채였다.
팬티를 내리자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석채의 물건이 벌떡 일어섰다.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는 은수의 팔을 풀어 물건으로 인도하자 은수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석채의 물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힘차게 왕복을 시작했다.
이미 석채의 귀두 끝에서도 물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마찰을 시켜줬다.
피가 몰리는 것을 느낀 석채가 은수의 팔목을 꽉 움켜쥐었다.
얼마나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은수의 손바닥 위에 정액을 쏟아낼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PC방 카운터를 교대했을 때를 틈타 일주일에 두 세 번 씩 석채와 미스정을 만나 밀회를 즐겼다.
석채는 다시는 별다방을 찾지 않았고, 미스정도 기정을 따먹은(?) 뒤로 돈을 좇아 가랑이를 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신의 불륜이 상대방에게 들키면 부부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이 두려웠다.
비록 각각 바람을 피우는 처지일망정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헤어지는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기정은 미스정에게, 은수는 석채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아………….아…좋아”
기정의 위에 올라탄 채 그의 물건을 자신의 보지 안에 깊이 감춘 미스정의 방아찧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삽인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베개를 겹쳐 베서 자신의 머리를 높게 만든 기정의 눈에 애액으로 번들거리는 물건이 미스정의 음모 아래쪽에서 솟구치듯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였다.
“오빠 좋아?….좋아?…………….아…. 좋아”
미스정이 특유의 비음을 내뿜어가며 소리를 질러댔다.
기정에게 묻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흥분을 이길 길이 없어 내뱉는 말이었다.
“아…아…미스정 미칠 것 같아”
“아직…싸지 마….오빠 좋아??…………….아…..미쳐”
마치 자신의 자궁벽까지 뚫어버리려는 것처럼 미스정은 기정의 귀두 끝이 거의 드러날 정도까지 몸을 올렸다가는 뿌리 끝까지 잠길 정도로 힘차게 내리찍었다.
한번 내리찍을 때마다 엄청난 크기의 유방이 흔들거리며 가슴 위에서 파도를 쳤다.
“철퍽…철퍽”
땀과 애액이 질펀하게 얽혀있는 두 사람의 삽입부분은 살끼리 마주칠 때마다 한낮의 모텔 방안에 묘한 음향을 만들어 냈다.
“아학…오빠…나 죽어!!!”
어느 순간 미스정의 질벽이 강하게 기정의 물건을 옭조였다.
질안에 만들어진 엄청난 애액의 홍수 속에서 수영하듯 자연스럽게 오가던 기정의 물건에 강한 자극이 왔다.
“아….싼다”
기정의 물건이 울컥하며 소방호스가 물을 뿜듯 정액을 쏟아냈다.
“하악….나도”
미스정의 앞으로 상체가 무너지며 기정의 상체와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버렸다.
미스정의 젖가슴 사이 계곡으로 흘러내리던 땀이 배꼽 부근에서 방울을 이루더니 기정의 배 위로 떨어져 내렸다.
미스정이 기정의 위에 엎드린 채 질을 힘껏 조였다.
마지막 남은 정액이 기정의 귀두 끝을 빠져나와 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항문 근처에 이르자 침대 시트위로 떨어졌다.
기정의 사타구니 아래는 이미 애액과 정액으로 마치 오줌을 싼 것 마냥 흠뻑 젖어 있었다.
“후…우”
두 사람의 결합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미스정이 조심스럽게 답배를 집어주자 기정은 불을 붙여 함모금 힘껏 빨았다.
사정의 후의 나른함이 밀려들었다.
몸매, 얼굴 어느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은수를 아내로 두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성적 매력이 미스정에게서는 물씬 흘러 나왔다.
사실 은수도 미스정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뜨거운 여자였지만 두 사람의 소극적인 잠자리가 서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못하게 만든 것 뿐이었다.
석채를 통해 은수도 섹스의 마력을 느꼈지만 기정은 여전히 은수가 섹스에 대해서는 그저 그런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섹스 머신 같은 미스정을 만났으니 손쉽게 빠져든 것은 당연했다.
그럴수록 은수에게 들킬 가능성은 높아져갔고, 걱정도 됐지만 이젠 일주일에 적어도 두 세번 이상 미스정을 만나지 않으면 몸살이 날 듯 했다.
같은 시간에 석채는 기정의 PC방에 있었다.
온라인 고스톱을 치면서 카운터의 은수를 훔쳐보고 있었지만 둘만 빠져 나올 방법이 없었다.
은수는 기정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고 말했지만 석채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별다방에 전화했을 때 미스정은 여섯 시간짜리 장기 티켓을 끊은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제 두 시간이 지났으니 기정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네 시간이나 남았다.
그러나 오늘따라 PC방은 거의 꽉 찼고 은수는 몸을 뺄 시간조차 없어보였다.
정신이 딴 데로 팔려있으니 고스톱 머니는 자꾸 줄어들어갔다.
안타까운건 은수도 마찬가지였다.
건녀편에서 석채가 눈빛을 보낼 때마다 아랫부분이 젖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은수는 카운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랑이 부분을 만져보았다.
하필이면 몸에 꼭 끼는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만지기도 불편했다.
얼마나 물이 흘렀는지 청바지 바깥쪽까지 젖어있는 것이 느껴졌다.
“은수씨 난데요. 듣기만 하세요”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된 석채는 카운터로 전화를 걸었다.
얼굴이 상기된 채 석채를 넘겨다 보는 은수의 모습이 보였다.
“카운터 맡길만한 사람 없어요?”
“저 쪽에 단골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은수는 누가 들을세라 작게 속삭였다.
“그럼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네”
전화를 끊은 은수는 열심히 채팅중인 단골 학생에게 다가갔다.
“학생 잠깐만 카운터 봐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응, 나 화장실이 급해서….10분이면 돼”
“그럴께요”
카운터로 돌아가면서 은수가 석채에게 눈을 찡긋해보였다.
석채는 카운터 앞의 과자 판매대에서 과자를 고르는 척 하다가 슬며서 카운터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은수가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엉켰다.
석채가 입을 갖다대자마자 은수가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열었다.
“하…아”
은수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했다.
석채는 키스를 하면서 선 채로 정신없이 은수의 옷을 벗겼다.
얇은 티셔츠와 브래지어뿐인 상의는 쉽게 벗겼지만 타이트한 청바지는 잘 벗겨지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 골반에 걸린 청바지를 벗기는 손이 자꾸 빗나갔다.
은수가 다리를 들어 도와주면서 간신히 청바지가 은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은수의 입술에서 얼굴을 뗀 석채가 청바지를 살폈다.
어디에선가 축축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청바지의 갈라지는 부분이 오줌 싼 것 처럼 젖어 있었다.
“보지 마세요”
석채가 뭘 보는지 알아챈 은수가 얼굴을 붉히며 뺏을 듯이 손을 뻗쳤다.
“은수씨 급했나봐요…하하하”
석채는 웃으며 청바지를 구석으로 던지고는 은수의 팬티로 손을 가져갔다.
아무 무늬도 없는 하늘색 팬티는 이미 흠뻑 젖어있었다.
젖은 팬티 너머로 마치 도끼자국처럼 갈라진 부분이 선명히 드러났고, 그 위로 검은색 음모가 살짝 비쳤다.
“빨리요. 금방 나가봐야 해요”
은수는 이제 창피함보다도 뜨거워진 몸을 달래는 것이 더 급해졌다.
적극적으로 양손을 석채 목뒤로 넘겨 석채의 입술을 찾았다.
석채는 은수의 혀를 받아들이며 두 손으로는 은수의 팬티를 벗겨 내렸다.
흘러내린 팬티가 은수의 미끈한 다리위로 미끌어지다 발목에 걸렸다.
음모 아래쪽으로 손을 대자 미끈한 액체가 손안에 가득 만져졌다.
은수의 옷을 모두 벗긴 석채는 서둘러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
두 사람의 혀는 여전히 상대방의 입안을 오가고 있는 채였다.
팬티를 내리자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석채의 물건이 벌떡 일어섰다.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는 은수의 팔을 풀어 물건으로 인도하자 은수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석채의 물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힘차게 왕복을 시작했다.
이미 석채의 귀두 끝에서도 물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마찰을 시켜줬다.
피가 몰리는 것을 느낀 석채가 은수의 팔목을 꽉 움켜쥐었다.
얼마나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은수의 손바닥 위에 정액을 쏟아낼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