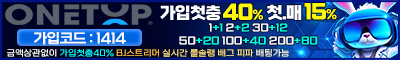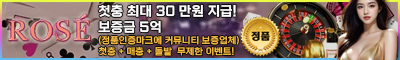만남 - 1부
관리자
경험담
0
5873
2018.12.23 13:44
아저씨를 따라간 작은 아파트는 방 하나 거실 겸 부엌, 화장실이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거실에 앉으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내오면서 목욕을 하라고 하였다. 마침 땀에 젖어 있던 차에 잘 되었다 싶어 욕실로 갔다.
"괜찮아. 그 때 봤는데. 밖에서 벗어도 돼."
하긴 그랬다. 난 아저씨가 보는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었다. 돌아서서 팬티를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저씨도 목욕한다며 들어왔다. 좁은 욕실에 난 그냥 욕조 안에 앉아 있고 아저씨는 밖에서 씼었다.
"일어나, 비누칠 해야지."
"제가 할께요."
"아냐 내가 씻겨줄께."
난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아저씨가 다 씻겨주었다. 정성껏 비누칠을 하고. 특히 자지와 항문을 정성껏 씻어주는 것 같았다. 비누칠도 여러번, 문지르는 것도. 좀 창피했다. 평소 내가 거긴 안씻었던 것 같아. 아저씨는 물기를 다 닦아주고 나가자고 했다. 옷을 입으려니까 땀에 젖은 옷 마르게 두리고 해서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니 아저씨가 날 침실로 잡고 들어갔다. 침실 가장자리에 앉아 아저씨 우표책을 보았다.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라는데 무엇을 고를까. 이것저것 고르는데 아저씨가 옆에서 내 자지를 살살 만진다.
"이걸로 할께요."
"그래, 넌 눈이 참 예쁘다. 자지도 예뻐. 난 네가 좋아."
아저씨가 날 침대에 눕히고 날 지긋이 쳐다본다. 난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가 내 머리를 잡더니 키스를 하였다. 아니 어떻게, 난 입을 꼭 다물었다.
"입 벌려봐."
입을 벌리니까 그 다음에는
"혀 내밀어 봐."
"우우"
혀가 빠지는 줄 알았다. 혀 끝이 알딸딸하다. 아저씨의 입이 나의 귓볼을 간지럽힌다. 혀가 귓속으로도 들어온다. 그리고 그 입이 내 목으로 내려오며 빨기 시작한다. 순간 내 몸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듯 몸이 확 젖혀진며 입에서 아 소리가 새 나왔다. 나도 모르게 아저씨의 벌거벗은 몸을 꽉 잡았다. 목을 잠시 머물던 입은 젖꼭지로 내려갔다. 젖꼭지가 아저씨의 입 속으로 들어가 빨리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시원하면서도 힘이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난 침대에 누워 내가 꿈을 꾸는 것 아니가 생각이 들었다. 한달 전만 해도 이런 것 몰랐던 내가. 빳빳한 자지가 찔리는지 아저씨가 위로 올려 누르더니 다시 내 입을 빨기 시작했다. 난 눈을 감고 아저씨에게 온몸을 맡겼다.
젖꼭지가 다시 유린당하고 빳빳한 자지가 빨딱빨딱 춤을 추었다. 가만 있어라. 창피하게. 그런데 어쩌랴. 아저씨 입이 내 몸을 빨 때마다 자지가 막 춤을 췄다. 아저씨가 자지 주변을 빨며 나의 자지를 보는 것 같았다. 불알도 빨렸다. 그리고 잠시후 자지가 따스해졌다. 또 아저씨 입에 점령 당했다. 아저씨가 빨 때 난 눈을 감고 손은 침대 시트를 꽉 쥐었다. 언젠가 어느 영화에서 여배우가 그렇게 하는걸 본 적이 있었다. 그냥 뭔가를 꽉 쥐고 싶기도 했다. 또 입에 싸나. 침대 대문에 엉덩이를 뺄 수도 없다. 그냥 엉덩이에 힘을 주며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얼마큼 하였을까? 아저씨가 내 손을 쥔다. 우리 손은 서로 깍지를 끼고 난 노를 젓듯이 손을 허부적겨렸다.
"아아악"
깍지 낀 손을 잡아당기며 난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훑었다. 하체는 아저씨 몸에 깔린 채, 자지는 아저씨 입에 물린 채, 난 그런 정경을 바라보며, 아저씨의 손을 잡아당기며 윗몸을 일으키며 부르르 떨었다. 전에는 바지만 내리고 했는데 오늘은 나체가 되어 아저씨와 한 것이었다. 아저씨의 입에서 풀려난 자지는 아직도 화가 난듯 벌떡거리고 있었다. 빨갛게 된 채
"너도 빨아볼래?"
"전 그런 거 못해요, 아저씨."
"조금만."
난 끝내 거절했다. 아저씨는 내 다리를 올리고 베개를 엉덩이 밑에 놓았다. 내 몸이 반으로 접혀진 것처럼. 아저씨가 위에서 날 보며 끼익 웃더니 내 항문에다 아저씨 자지를 밀어넣었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
"아파요."
"힘 빼. 조금만 힘 빼."
"아픈데."
난 도저히 힘을 뺄 수 없었다. 조금만 힘을 빼면 아저씨 자지가 들어올 것 같았다. 아저씨는 끝내 항문 삽입을 못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난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전에는 모르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또 만나자고 날짜를 정했지만 나가지 않았다. 항문이 너무나 아파 겁이 났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을 팔고 번 우표도 이 사람 저 사람 주고 다 사라졌다. 우표 수집도 흐지부지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린 나이에 매춘을 한 것이 되었다. 그 새로운 세상은 내 앞에서 사라진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중학교 수학여행에서 그 세계를 또 한번 만나게 되니 여자 아이처럼 곱게 생긴 외모는 그 값을 하는 것인가..
"괜찮아. 그 때 봤는데. 밖에서 벗어도 돼."
하긴 그랬다. 난 아저씨가 보는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었다. 돌아서서 팬티를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저씨도 목욕한다며 들어왔다. 좁은 욕실에 난 그냥 욕조 안에 앉아 있고 아저씨는 밖에서 씼었다.
"일어나, 비누칠 해야지."
"제가 할께요."
"아냐 내가 씻겨줄께."
난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아저씨가 다 씻겨주었다. 정성껏 비누칠을 하고. 특히 자지와 항문을 정성껏 씻어주는 것 같았다. 비누칠도 여러번, 문지르는 것도. 좀 창피했다. 평소 내가 거긴 안씻었던 것 같아. 아저씨는 물기를 다 닦아주고 나가자고 했다. 옷을 입으려니까 땀에 젖은 옷 마르게 두리고 해서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니 아저씨가 날 침실로 잡고 들어갔다. 침실 가장자리에 앉아 아저씨 우표책을 보았다.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라는데 무엇을 고를까. 이것저것 고르는데 아저씨가 옆에서 내 자지를 살살 만진다.
"이걸로 할께요."
"그래, 넌 눈이 참 예쁘다. 자지도 예뻐. 난 네가 좋아."
아저씨가 날 침대에 눕히고 날 지긋이 쳐다본다. 난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가 내 머리를 잡더니 키스를 하였다. 아니 어떻게, 난 입을 꼭 다물었다.
"입 벌려봐."
입을 벌리니까 그 다음에는
"혀 내밀어 봐."
"우우"
혀가 빠지는 줄 알았다. 혀 끝이 알딸딸하다. 아저씨의 입이 나의 귓볼을 간지럽힌다. 혀가 귓속으로도 들어온다. 그리고 그 입이 내 목으로 내려오며 빨기 시작한다. 순간 내 몸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듯 몸이 확 젖혀진며 입에서 아 소리가 새 나왔다. 나도 모르게 아저씨의 벌거벗은 몸을 꽉 잡았다. 목을 잠시 머물던 입은 젖꼭지로 내려갔다. 젖꼭지가 아저씨의 입 속으로 들어가 빨리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시원하면서도 힘이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난 침대에 누워 내가 꿈을 꾸는 것 아니가 생각이 들었다. 한달 전만 해도 이런 것 몰랐던 내가. 빳빳한 자지가 찔리는지 아저씨가 위로 올려 누르더니 다시 내 입을 빨기 시작했다. 난 눈을 감고 아저씨에게 온몸을 맡겼다.
젖꼭지가 다시 유린당하고 빳빳한 자지가 빨딱빨딱 춤을 추었다. 가만 있어라. 창피하게. 그런데 어쩌랴. 아저씨 입이 내 몸을 빨 때마다 자지가 막 춤을 췄다. 아저씨가 자지 주변을 빨며 나의 자지를 보는 것 같았다. 불알도 빨렸다. 그리고 잠시후 자지가 따스해졌다. 또 아저씨 입에 점령 당했다. 아저씨가 빨 때 난 눈을 감고 손은 침대 시트를 꽉 쥐었다. 언젠가 어느 영화에서 여배우가 그렇게 하는걸 본 적이 있었다. 그냥 뭔가를 꽉 쥐고 싶기도 했다. 또 입에 싸나. 침대 대문에 엉덩이를 뺄 수도 없다. 그냥 엉덩이에 힘을 주며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얼마큼 하였을까? 아저씨가 내 손을 쥔다. 우리 손은 서로 깍지를 끼고 난 노를 젓듯이 손을 허부적겨렸다.
"아아악"
깍지 낀 손을 잡아당기며 난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훑었다. 하체는 아저씨 몸에 깔린 채, 자지는 아저씨 입에 물린 채, 난 그런 정경을 바라보며, 아저씨의 손을 잡아당기며 윗몸을 일으키며 부르르 떨었다. 전에는 바지만 내리고 했는데 오늘은 나체가 되어 아저씨와 한 것이었다. 아저씨의 입에서 풀려난 자지는 아직도 화가 난듯 벌떡거리고 있었다. 빨갛게 된 채
"너도 빨아볼래?"
"전 그런 거 못해요, 아저씨."
"조금만."
난 끝내 거절했다. 아저씨는 내 다리를 올리고 베개를 엉덩이 밑에 놓았다. 내 몸이 반으로 접혀진 것처럼. 아저씨가 위에서 날 보며 끼익 웃더니 내 항문에다 아저씨 자지를 밀어넣었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
"아파요."
"힘 빼. 조금만 힘 빼."
"아픈데."
난 도저히 힘을 뺄 수 없었다. 조금만 힘을 빼면 아저씨 자지가 들어올 것 같았다. 아저씨는 끝내 항문 삽입을 못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난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전에는 모르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또 만나자고 날짜를 정했지만 나가지 않았다. 항문이 너무나 아파 겁이 났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을 팔고 번 우표도 이 사람 저 사람 주고 다 사라졌다. 우표 수집도 흐지부지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린 나이에 매춘을 한 것이 되었다. 그 새로운 세상은 내 앞에서 사라진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중학교 수학여행에서 그 세계를 또 한번 만나게 되니 여자 아이처럼 곱게 생긴 외모는 그 값을 하는 것인가..